주요활동
대붕기 우승
작성자 : 이성현
작성일 : 2008.08.08 17:08
조회수 : 11,888
본문
∙올해 대붕기 결국 승리… 29년만에 꿈 이뤄
1979년 인천은 한해 내내 야구 이야기로 온통 술렁였다.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인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전국 고교야구 대회에서 인천의 야구 명문 인천고(이하 인고)가 4번이나 준우승을 했기 때문이다. 대붕기, 황금사자기, 봉황대기, 전국체전 등 4개 대회에서 인고는 전국의 강호들을 줄줄이 꺾으며 결승에 올라 시민들을 흥분시켰다.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인고 야구단의 선전에 환호하고, 또 가슴을 졸였다.
하지만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듯 4번 모두 우승의 문턱은 끝내 넘어서지 못해 아쉬움에 잠기게 했다. 그 흥분과 한숨의 한가운데에 당시 인고 야구부의 3학년 에이스 투수였던 최계훈(崔桂勳·47) 선수가 있었다. 위력적인, 때로는 변화가 심한 그의 공 앞에 상대팀 타자들은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고교야구 마운드를 호령하던 그가 29년이 지나 모교의 야구부 감독으로 전국대회에 나가 마침내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난 14일 대구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대붕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강호 성남고를 5대 0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안은 것이다.
"인하대 야구부에 진학한 1980년에도 대통령배 대회에 나가 또 준우승을 했어요. 만년 준우승이라는 별명이 생겼죠. 그 별명을 이제 와서 지우네요."
최 감독은 우승이 확정된 순간 기쁘기보단 오히려 허탈하더라고 했다. "그렇게 원했던 일인데 막상 하고 나니까 왠지 허무했어요. 그동안 왜 그토록 허둥대며 살아왔을까 하는 마음 같은 것…." 마냥 우쭐거렸을 고교생 선수에서 이제 지천명(知天命)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성숙함 때문일지도 모른다.
▲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최계훈 감독이 후배 선수의 타격 폼을 고쳐 주고 있다. 김용국 기자 young@chosun
창영초등 3학년 때 형의 권유로 시작했다는 그의 야구 인생은 고교시절을 거쳐 1984년 삼미슈퍼스타스 입단까지 화려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3년 뒤 군대에 가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체육부대가 없어 일반병으로 갔어요. 3년 동안 야구를 못 하다 보니 야구에 쓰는 근육들이 다 원래대로 돌아와서인지 안 되더라고요."
전역 뒤 2년여 동안 다시 투수로 뛰었지만 결국 91년 현역 생활을 접고 공채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심판 자격증을 땄다. 그 뒤 태평양과 SK 등에서 투수코치로 활동하다가 지난 4월 선후배의 추천으로 인고 야구부의 지휘봉을 잡았다.
"후회는 없어요. 현역도 언젠가는 그만둬야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야구든, 인생이든."
최 감독은 후배 선수들에게 기본기를 가장 강조한다고 했다. "야구는 잘 던지고 잘 받아야 해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나도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 고심하다가 이렇게 머리가 희어졌어요."
온통 하얗게 센 머리칼을 가리키며 씩 웃는 그에게 "야구의 매력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
"야구는 인생이나 날씨와 같다고 생각해요. 맑을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그걸 어떻게 참고, 견디고, 연구하고,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죠. "
그는 모교의 감독으로서도 좋은 성적보다는 좋은 선수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용 기자 jychoi@chosun.com
입력 : 2008.07.21 2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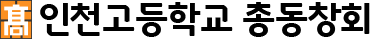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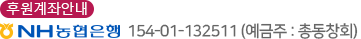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
이주대님의 댓글
정말 자랑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