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자 들고 불러보지만… 4일 오후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에서 김복자 할머니가 과자봉지를 들고 갈매기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손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갈매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주말이면 겨울바다를 보기 위해 북적대던 관광객들도 자취를 감췄다. 태안=지명훈 동아일보 기자 | 오늘도 바닷가 찾은 ‘만리포 갈매기 할머니’
“갈매기야. 설 지나면 돌아올 거지.” 4일 해양오염 사고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이곳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며 생계를 꾸리는 김복자(67)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설 명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평소 친자식처럼 아꼈던 갈매기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름유출 사고 이후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게 앞쪽으로 20m 떨어진 백사장에 나가곤 한다. 수평선 너머 먼 바다를 바라보며 행여나 갈매기가 있는지부터 살피는 게 일과가 됐다. 그럴 때면 으레 ‘부산 갈매기’라는 유행가를 ‘태안 갈매기’로 바꿔 부른 지도 오래다.
하지만 갈매기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기름사고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말 잠시 갈매기 10여 마리가 모습을 보여 가슴이 설렜지만 이내 자취를 감추었다.
김 할머니의 갈매기 사랑은 각별했다. 이 일대에선 ‘갈매기 할머니’로 더 유명하다. 그가 새우깡을 쥔 손을 하늘 높이 흔들며 “갈매기야, 갈매기야, 꽉꽉” 하고 부르면 갈매기들이 수백 마리씩 모여들어 장관을 연출했다.
갈매기도 김 할머니의 사랑을 느낀 것일까. 갈매기들은 어미의 품으로 여기듯 그의 품안을 파고든다.
이웃 주민 국영호(67) 씨는 “갈매기들이 분명 김 씨의 목소리나 몸 냄새를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을 찾는 사진작가들도 갈매기를 근접 촬영하기 위해선 김 할머니를 찾는다. ‘갈매기 할머니’라는 명성이 인근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의 갈매기 사랑은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려서 인근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천수만 철새도래지 인근의 바닷가에 살 때부터 갈매기를 보고 자란 것. 친정어머니는 매일 갈매기에 얽힌 전설을 자장가처럼 들려줬다고 한다.
결혼해 만리포로 옮겨 살면서 갈매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땐 “어머니의 물레소리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1995년 남편이 세상을 뜨면서 그에게 갈매기는 더는 단순한 새가 아니었다.
“정말 애틋하고 정겨운 남편이었는데 한번 떠나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고. 하지만 갈매기는 어디론가 갔다가도 항상 다시 찾아오지. 사람은 갈매기만 못한 것이여….”
갈매기에 대한 그의 애정은 숙연할 정도라고 한다. 날개를 다쳐 날지 못하는 갈매기를 발견하면 친자식을 돌보듯 동물병원에서 정성껏 치료한 뒤 날려 보냈다. 갈매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 2, 3일에 한 번씩 먹을 것을 챙겨서 원기를 회복시켰다.
갈매기가 사라진 것은 지난해 말 기름 유출 사고 직후였다. 해변을 덮친 검은 기름이 더 없이 미운 것도 이 때문이다.
“갈매기는 해변에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겨울에는 덜 찾아오지. 하지만 전에는 조금만 날씨가 풀려도 꼭 다시 찾아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기름이 많이 걷혔다고 하지만 갈매기가 오지 않는 것은 기름 냄새 때문이야.”
김 할머니는 “갈매기는 생선 내장도 썩은 것은 먹지 않을 정도로 사람과 같이 식성이 까다롭고 오염에 대해서는 민감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가의도나 옹도 등 주변 섬 사람들에게도 갈매기가 왔는지 수소문을 해봤지만 그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빨리 갈매기들이 만리포 바닷가를 훨훨 날아다녀야 할 텐데….”
해질녘 겨울 바닷바람은 매서웠지만 그에게 ‘갈매기의 꿈’은 깊어만 갔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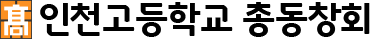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