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술이라 하면 당(唐)의 시인 이백(李白)을 먼저 떠올린다.
그만큼 술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문학과 철학의 원천이었다.
술에 관한 시도 숱하게 썼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월하독작(月下獨酌) 2편 한 귀절의 의미를 새겨보고 4편까지 전문을 정리했다.
|

|
월하독작 2(月下獨酌 2) - 이백(李白)
|
天若不愛酒(천약불애주)
酒星不在天(주성부재천)
地若不愛酒(지약불애주)
地應無酒泉(지응무주천)
天地旣愛酒(천지기애주)
愛酒不愧天(애주불괴천)
|
하늘이 만약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주성이 하늘에 없을 것이다
땅이 만약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땅엔 응당 주천이 없을 것이다
하늘과 땅이 이미 술을 좋아하였으니
술을 좋아함이 하늘에 부끄럽지 않도다
| |

"꽃나무 사이에 놓인 한 병의 술을 / 친한 이 없이 혼자 마시네 / 잔 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니 / 그림자까지 셋이 되었구나 / (중략) 내가 노래하니 달은 거닐고 /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도 따라하네 / 깨어서는 함께 즐기고 / 취한 뒤에는 각자 흩어지는 것 / 무정한 인연을 길이 맺었으니 / 아득한 은하에서 다시 만나기를."
이백(李白, 701~762)의 시 `월하독작(月下獨酌)`이다.
어느 봄 밤, 시인 이백은 달 아래서 혼자 술을 마신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하늘에 있는 달, 그리고 달빛이 만든 내 그림자까지 모두 셋이다. 달빛은 내 노래를 따라 흐르고, 그림자는 나를 따라 춤을 춘다. 그들과 언젠가는 헤어지겠지만 은하에서 다시 만나면 될 뿐이다. 시적 낭만의 극치다.

'이태백'이라는 아호로 더 많이 알려진 이백은 중국 당나라 때 시인이다. 사람들은 동시대 시인 두보를 시성(詩聖)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비해 이백을 시선(詩仙)이라고 부르길 좋아한다. 초월로 시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이백과 더 잘 어울리는 호칭은 `적선(謫仙)`이다. 가까운 문우였던 하지장이 이백이 처음 장안에 나타났을 때 그의 시를 읽고 감탄한 나머지 붙여준 호칭으로 `귀양살이 와 있는 신선`이라는 의미다. 이백의 일생을 들여다 보면 완전무결해 보이는 `시선`이라는 별칭보다는 선계에서 죄를 짓고 인간계로 쫓겨온 신선을 뜻하는 `적선`이 더 잘 어울린다. 이백시선(현암사)을 번역하고 해설한 이원섭은 이백의 일생에 대해 "한 발은 천상에 걸치고, 한 발은 땅에 둔 채 `적선`으로서의 영광과 자기 모순을 짊어지고 살았다"고 정리한다.
이백은 실제로 선계만을 노닐던 유유자적한 시인은 아니었다.
그의 생에 대해선 많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추정이 대부분이지만 그가 현실적인 울분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상인의 아들로 서역에서 태어나 쓰촨성에서 성장했다는 설이 유력한 이백은 어린 시절부터 현실적인 유교보다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도교에 빠져 지냈다. 산천을 떠돌기도 하고 검술 같은 선술(仙術)을 연마하기도 했지만, 그는 현실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중 42세 때 현종의 부름을 받고 궁정에 들어가게 된다. 탁월한 문장력으로 현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것도 잠시, 당나라에 대한 반감과 자유분방한 기질로 정치권에 적응하지 못하고 궁에서 쫓겨난다. 궁을 나와 방랑생활을 하던 그는 안녹산의 난 이후 벌어진 권력투쟁에 다시 휘말리면서 구이저우(貴州)로 유배되는 등 고초를 겪다 62세 때 친척 집에서 병사한다. 일설에는 그가 술에 취해 호수에 비친 달을 건지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지만 그건 호사가들의 소설일 뿐이다.
이백은 생전 1100여 편의 시를 남겼다. 타고난 로맨티시스트였던 그의 시는 대부분 열정과 우수, 자유와 방랑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모티프가 바로 술이다. 월하독작의 기이(其二) 편을 보자.
"하늘이 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 주성(酒星)은 하늘에 없을 것이고 / 땅이 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 땅에는 주천(酒泉)이 없을 거야 / 천지가 이미 술을 사랑했으니 / 술을 사랑함이 하늘에 부끄럽지 않네 / 옛말에, 청주는 성인과 같고 / 탁주는 현인에 견준다고 하였네 / 현인과 성인을 이미 들이켰으니 / 굳이 신선을 찾을 일 없네."
그에게서 술은 하나의 실천 수단이자 문학과 철학의 원천이었다. 두보는 자신보다 열한 살 위였던 이백에 대해 "붓을 대면 비바람도 놀랐고, 시를 쓰면 귀신을 울게 했다"고 찬사하면서 "술 한 말에 시가 백 편"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백은 시를 쓰기보다는 쏟아낸 사람이었다. 그의 시는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섬광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이었다. 그가 `귀양살이 온 신선`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출 처 ; MK뉴스>
|

月下獨酌 달 아래 홀로 술을 마시며
이백(701~7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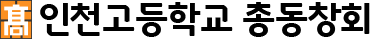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