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계석
正面敎師... 스포츠조선(펌)
본문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분명히 있을듯싶어 퍼왔습니다.
타교 기사라 거부감도 있겠지마는 기꺼이 읽어주시지요...
'공부하면서 우승도 한다' 덕수고 야구부가 강한 이유는
6월 하순, 청명한 오후의 하늘은 푸르고 맑았다. 명도가 높은 하늘빛은 무척이나 상쾌하게 보인다. 하지만 속아서는 안된다. 내리쬐는 햇볕이 금세 사람을 젖은 빨래처럼 늘어지게 만든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땀 범벅이 되고, 짙은 선글래스를 써도 눈이 시리다.그러나 까까머리 '야구 소년'들에게 이 정도 더위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인다. 외려 경쟁이라도 하듯 우렁찬 구호를 외치며 뛰고 던지는데 몰입한다. 어쩌면 이 '야구 소년'들은 날씨가 조금 덥더라도 꿈을 위해 땀을 흘릴 수 있는 이 시간 자체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최근 몇 년간 각종 전국대회 우승을 휩쓸면서도 지난해 서울대 입학생을 만들어 낸 서울 덕수고등학교 야구부를 만났다. 덕수고 야구부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4교시 수업을 마친 뒤에야 훈련을 시작한다. 선수이기 전에 학생 본연의 자세를 강조하는 전통 때문이다.
▶덕수고 야구부에는 '네 가지'가 없다.
지난 9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제67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결승에서 덕수고는 마산고를 4대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04년(제58회) 이후 9년만에 다시 찾은 우승컵이다.지난해에도 덕수고는 제67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전반기 왕중왕전인 황금사자기까지 제패했다. 2011년 고교야구에 주말리그제가 도입된 이후 전반기 왕중왕전과 후반기 왕중왕전을 연달아 석권한 것은 덕수고가 유일하다.연거푸 우승을 거두면 자연스럽게 여러모로 주목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면 아직 생각이 덜 여문 10대의 아이들은 쉽게 스타의식에 빠져들 수도 있다. 하지마 덕수고 야구부의 분위기는 달랐다. 야구를 하기에 앞서 예의와 인성을 강조하는 팀의 전통이 생생히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덕수고에는 다른 학교와 달리 '네 가지'가 없다. 바로 휴대전화와 긴 머리, 건강목걸이 그리고 주전 보장이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시대다. 하지만 덕수고 야구부원들은 예외다. 지난 2007년부터 지휘봉을 잡은 정윤진(42) 감독이 만들어놓은 전통이다.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는데, 학부모들도 이런 취지를 흔쾌히 받아들여 새로운 전통으로 굳어졌다.두발 형태도 일괄적으로 짧은 스포츠형 스타일이다. 무엇보다 덕수고 야구부원들에게서는 건강목걸이나 팔찌가 보이지 않는다. 몇 년전, 목동구장에서 열린 고교야구대회를 지켜보던 한 프로팀 스카우트는 "목걸이며, 팔찌며 선글래스까지 겉모양은 프로선수들하고 똑같이 꾸미고 다니는데, 실력은 점점 떨어진다"며 한탄을 한 적이 있다. 화려한 외양보다 내실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가는 후배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한 말이다.정 감독 역시 그런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 장식품이 실력을 향상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연습과 각자 흘리는 땀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선수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덕수고에는 고학년이 주전 자리를 보장받는 분위기도 없다. 덕수고 야구부를 이끄는 김창배 야구부장 교사는 "우리 학교가 강한 이유 중 하나는 치열한 주전 경쟁을 거치기 때문이다. 1학년 때부터 똑같이 경쟁해서 올라온 선수가 주전이 된다. 그런 경쟁이 선수들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나처럼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주마.
이런 전통들로 인해 덕수고는 현재 명실상부한 강팀으로 인정받는다. 계속 좋은 선수를 뽑았고, 동문회와 학교의 지원도 풍부했다. 하지만 이렇게 덕수고가 강해진 데에는 19년째 모교 야구부를 이끌고 있는 정 감독의 열정을 빼놓을 수 없다. 때때로 선수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도자로서는 역량을 발휘하는 인물들이 있다. 정 감독 역시 이에 해당한다.덕수중고를 졸업한 정 감독은 프로팀 입단에 실패했다. 어깨부상도 있었고, 기량도 부족했다. 93년에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친 뒤 잠시 LG에 입단테스트를 받았지만, 여기서도 잘 풀리지 않았다. 20대 초반에 앞길이 막막했다.그때 모교가 정 감독을 불렀다. 당시에는 막내 코치였다. 1994년, 20대 초반의 피끓는 청년이 큰 좌절을 경험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한 시점이다. 자연스럽게 열정이 불타올랐다. 정 감독은 "후배들이 나처럼 좌절하지 않게 만들겠다"며 이를 악물었다. 스스로 '악마'처럼 훈련을 시켰다고 했다.현재 덕수고 투수코치를 맡고 있는 김민기 전 LG투수가 바로 이 시기에 정 감독의 지도를 받은 제자다. 김 코치는 "그 당시 감독님의 열정을 우리가 못쫓아갈 정도였다. 밤 12시에 사비로 식빵을 사오신 뒤 직접 잼을 발라주시면서 새벽 2~3시까지 훈련을 시키곤 했다"면서 "그때는 버거웠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알 듯하다"고 말했다.1994년부터 2006년까지 코치를 맡았던 정 감독은 2007년에 정식 감독이 됐다. 2008년 대통령배에서 감독으로 첫 우승을 달성했고, 그해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 대회에도 코치로 참가해 우승을 일궈냈다. 지금 프로에서 뛰는 이용규(KIA)와 민병헌(두산) 최진행(한화) 김민성(넥센) 김문호(롯데) 등이 정 감독의 제자들이다.정 감독은 자신이 겪은 실패의 고통을 후배이자 제자들이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처음 코치가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만으로 부족했다. 더 배우면 더 많이 가르쳐줄 수 있으리라고 여겨 코치 시절 한양대와 동대학원(교육학과)을 마쳤다. 그러다보니 20~30대가 훌쩍 지나갔다.마흔이 넘어서야 장가를 간 정 감독은 아직도 집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30연승'과 '청룡기 3연패'가 목표라고 한다.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코치 시절부터 해오던 '악마의 유혹'을 여전히 선수들에게 속삭이곤 한다. "이따 저녁먹고 잠깐 나랑 특타 치지 않을래? 잠깐이면 돼." 거짓말이다. 정 감독의 "잠깐"은 적어도 한 시간이다.
▶제2의 '이정호'를 만들기 위해.
덕수고가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것은 비단 야구를 잘해서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3학년 졸업반이었던 이정호를 서울대에 진학시키면서 '공부하는 야구선수'를 가장 잘 키우고 있는 학교의 대명사가 됐다. 사실 주말리그가 시행된 것도 학생 야구선수들이 너무 야구 자체에만 몰입하는 것을 우려해서였다.김창배 야구부장과 정윤진 감독은 주말리그 시행 이후 선수들이 공부도 야구만큼 잘 하도록 강조했다. 물론 일반 학생들만큼의 성적을 내는 게 무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업을 받고, 원한다면 야간자율학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그 결과가 이정호의 서울대 입학으로 맺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제2, 제3의 이정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김 부장교사는 "물론 또 다른 이정호의 케이스를 찾으려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말이 돌아왔다. 김 부장교사는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도 기초가 뒷받침돼야 잘 할수 있다. 이정호도 입학 당시에 이미 내신이 상위 20% 안에 들어 있었다. 결국 제2의 이정호가 나오려면 고교 입학 이전, 즉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다.결국 '공부하는 선수'의 분위기가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져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또 다른 '서울대생 이정호'도 나올 수 있다는 게 김 부장교사의 생각이다. 정 감독 역시 이에 동의한다. '야구 기계'가 아닌 '학생 야구선수'을 키워내기 위해서 덕수고의 성공 사례를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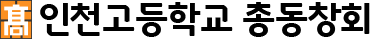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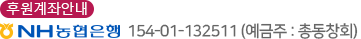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