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유엔과 한반도 두 의석(퍼온글)
본문
퍼온곳 : 기호일보(25.10.22)
유엔과 한반도 두 의석
/원현린 주필(主筆)

원현린 주필
원문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772
“한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나 우리는 하나의 겨레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다른 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유엔 대표단의 자리가 옵서버석에서 회원석으로 불과 수 십m 옮겨 오는데 40년 넘어 걸렸고 동·서독의 두 의석이 하나로 합쳐 지는 데는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두 의석이 하나로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한 얼을 확인하고 깊은 믿음을 회복해 평화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것입니다. 동서냉전의 마지막 유산인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경계선이 지도에서 사라질 때 세계는 비로소 냉전시대와의 완전한 결별을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분단된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긴장과 대립의 중심이 됐듯이 통일된 한반도는 이 지역에 평화와 번영의 가교가 될 것입니다.”
앞의 글은 지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당시 노태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공동체를 향하여’라는 제하에 행한 제46차 유엔총회 연설 내용 중 일부다. 뒷 문장은 1년 뒤인 1992년 가을 유엔을 다시 찾아 ‘평화와 번영의 21세기를 향하여’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역설한 내용이다.
또다시 돌아오는 10월 24일 국제연합일(UN Day)이다. 필자는 해마다 유엔의 날을 맞으면 마음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으로 달려가곤 한다. 유엔 가입 당시와 이듬해까지 두 번에 걸쳐 유엔총회 취재에 임했던 기억이 새롭게 떠 오르기 때문이다. 유엔 가입 첫 기념연설에서 보이듯 당시 한반도는 두 국가로 나뉘어 유엔에 가입했다. 두 의석이 곧 하나로 합쳐지는 데 그리 멀지 않았다고 확신한 우리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던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두 국가론’이 새로운 논쟁이 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며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과는 다르다.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야권은 즉각 두 국가론은 현행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통일부 장관은 두 국가로 인정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의 해석과 통일 방안은 정부의 일개 부처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결정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헌법 제정권력자와 개정권력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동법 제3조). 이어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아로새기고 있다.
영토는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헌법학자는 “헌법과 현실이 어긋난다고 헌법을 현실에 맞춰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현실을 바꿔 헌법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에게는 통일을 달성해 헌법의 규범력을 완성할 책무가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분구필합(分久必合), 나누어진 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진다 했다. 우리에겐 유엔의 두 의석을 하나의 의석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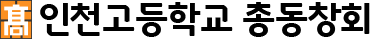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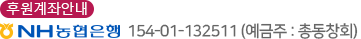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