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경호(67회) 월요프리즘/불 드 쉬프(퍼온글)
본문
퍼온곳 : 기호일보(12.10.15)
월요프리즘/
불 드 쉬프
/이경호 영림목재 대표
 |
▲ 이경호 영림목재 대표
끊임없이 내리는 눈 사이로 네 필의 말이 끄는 큰 합승마차에 열 사람이 국경을 넘어 가게 되었다. 그 중 일곱 명은 권력과 도덕심을 갖고 있는 사회의 특권계급에 속하는 훌륭한 사회의 남·녀 인사들이었고, 두 명은 긴 묵주를 만지작거리며 주의 기도와 성모 마리아의 기도를 중얼거리고 있는 수녀들이었는데, 또 한 명은 세상이 매춘부라고 부르는 종류의 젊은 여성이었다. 마차에 동승한 그들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는 ‘매음’이니 ‘사회의 수치’니 소곤소곤 귓속말로 해대기 시작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바퀴가 눈 속에 파묻히면서 속도가 느려졌고 때론 마차가 산처럼 쌓인 눈 속에 빠져버려 다시 마차를 끌어내는데 두 시간이나 걸렸다. 그런데 가도가도 주위엔 음식점 하나, 술집 하나 보이지 않았다. 승객들은 공복감이 더해가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모두 먹고 싶은 안타까운 욕망이 점점 더 심해져만 갔으며, 한 부자 승객은 돼지 다릿살 한 조각에 1천 프랑을 주어도 좋겠노라고 잘라 말했고 “왜 음식을 가지고 올 생각을 미처 못했담?”하고 백작이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때 젊은 여성이 걸상 밑에서 흰 보자기가 덮인 커다란 바구니를 꺼내 먹기 좋게 칼질한 통닭 두 마리, 파이, 과일, 과자 및 네 개의 술병을 꺼내어 빵 조각과 함께 얌전하게 먹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여자로 향했다. 이윽고 음식 냄새가 퍼지면서 옆 사람들은 콧구멍이 활짝 열리고 입안에는 가득 침이 괴며 귀 밑의 턱은 긴장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이 분위기를 깨달은 젊은 여성이 “좀 드시겠어요, 좋으시다면?”라는 말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두 수녀를 포함한 모든 동승인들이 왕성한 식욕을 발휘해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다. 마침내 열네 시간이나 걸린 끝에 검문소에 도착했다. 마차 문이 열리자 키가 큰 젊은 독일군 장교가 서 있었다. 모두 내려 출발 허가증을 조사받았는데 즉시 출발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출발 허가가 나지 않아 당황하기 시작한 그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독일 장교가 그 젊은 여자승객의 몸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승자들의 피곤한 빛이 또렷해지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들이 작당해 수녀들의 얘기를 들먹이고 달래가며 모두를 위해 희생해주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감언으로 간청하자, 젊은 여성은 마지못해 수락하고 만다. 얼마 후 열 명을 모두 실은 마차는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와 다시 여로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 젊은 여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는커녕 다시 거만하게 굴면서, 마치 그녀가 스커트 자락에 무슨 병균이나 묻혀 온 것처럼 될 수 있는 대로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길을 떠난 지 세 시간이 지나자 백작 부인이 보자기를 꺼내 쇠고기 조각을 꺼내 먹기 시작하자, 두 수녀도 순대 뭉치를 펼쳐 놓았으며 다른 동행인들도 삶은 계란과 빵 등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이 젊은 여성은 잠자리에서 허겁지겁 일어나 나오는 바람에 아무 것도 준비할 경황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전혀 음식을 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화가 나고 분노로 숨이 막힐 듯 했지만 아무도, 수녀들조차도 그녀를 바라보려고도, 그녀를 생각해 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달리는 마차에서 줄곧 울고 있었다. 이상은 모파상의 ‘비계덩어리(불 드 쉬프)’의 줄거리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작년에 모 일간지에 ‘주당론(酒黨論)’이라는 글을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 술을 즐기시고 많이 드시는 인천지역 어르신네들의 실명을 게재한 이유로 내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술을 가까이 해 온 나로서는 근래에 이르러 가끔 술좌석의 내용이 기억도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예전과는 달리 뜻밖에 실수도 범하기도 해 이제는 주당파 부류에서 조용히 물러날 때가 된 듯 싶다. 더군다나 술을 못 드시는 분이 합석했을 경우 그 다음 날에 전날의 좌석상태를 생생히 재생시켜줄 때에는 정말 뭐라 할 말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술좌석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해온 주당의 역할은 이제 그만 사양해볼까 자문해본다. 비계덩어리의 저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기 전에 말이다. 고민 끝에 시선(詩仙)이며 주선(酒仙)인 이백(李白)에게 금주(禁酒)여부를 간곡히 물어보니 ‘월하독작(月下獨酌)’을 통해 이렇듯 답변이 오는 게 아닌가! “이 세상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지 아니하면<當代不樂飮>/죽은 뒤에 허망한 이름 무슨 소용있는가?<虛名安用哉>.” 아무래도 내일모레까지는 일단 술을 마셔보고 다시 생각해봐야 하겠다.
2012년 10월 15일 (월)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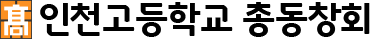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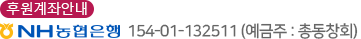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