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원규(65회) 새 책 [김산 평전] 제1~2장
본문
제1부 출생과 청년시절
제1장 출생과 성장
러일전쟁 포성 속에 태어나다
을사년(乙巳年. 1905년) 5월 12일. 음력으로는 3월 12일로 춥지도 덥지도 않은 봄과 여름의 중간이었다. 평안북도 용천군의 덕봉산(德奉山) 골짜기, 어른 손바닥처럼 커진 잎사귀들을 달고 있는 떡갈나무 가지들 사이로 움막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지난해 이맘때 불이 붙었다가 딴 곳으로 옮겨 갔던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마지막 결판을 내기 위해 다시 용천 땅으로 밀려오자 집을 버리고 피난한 민초들의 움막이었다.
그것들 가운데는 5리 쯤 떨어진 하장동(下長洞)의 인동 장씨(仁同張氏) 집안 사람들의 거처도 있었다. 용천 땅은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는 최단거리 길목이라 옛날부터 전쟁터가 된 적이 많았다. 사람들은 전란이 날 때마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산 속으로 피해 반 길쯤 깊게 땅을 팠다. 그 위에 나무를 잘라다가 삼각 지붕의 틀을 만들어 얹고 거기에다 풀잎으로 이엉을 엮어 덮었다. 그리고 바닥에다 왕골이나 부들로 만든 돗자리를 깔면 대여섯 식구는 몸을 의탁할 수 있었다. 덕봉산은 크지 않은 산이지만 숲이 우거졌으며 골짜기가 깊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었다.
마흔이 조금 넘은 장 주부(主簿). 그는 쿵 하는 발사 폭음에 이어 하늘을 찢어발기고 날아가는 포탄의 비행음에 귀를 기울이며 이마에 내 천(川)자 주름이 만들어지도록 낯을 찡그렸다. 성깔 있는 그의 얼굴이 더 사나워졌다. 젊은 날에 용천 관아 이방(吏房) 밑에서 장부 적은 일을 한두 해 맡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주부라는 호칭이 붙었다.
“제기랄, 왜 이런 때 애를 낳는 거야. 망할 놈의 여편네.”
그는 중얼거리며 골짜기 입구에 세워둔 수레를 바라보았다. 수레가 선 오솔길 위쪽 둔덕에는 그의 조부모와 부모의 무덤이 자리잡고 있었다. 포탄은 근처 어딘가에서 발사되어 용골산(龍骨山)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러니 여차하면 움막도 버리고 수레에 살림살이와 식구들을 싣고 꽁무니에 불이 붙은 듯 달아나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코사크 기병대에 걸리면 다 소용 없는 일일 것이었다. 그놈들은 바람보다 더 빨리 달리며 닥치는 대로 총을 쏘았다.
움막의 거적문이 열리고 산파를 맡은 재당숙모가 삿대질하듯이 팔을 뻗치며 소리쳤다.
“또 아들이네. 무 뽑듯이 쉽게 쑥 낳았구먼. 어서 화덕에 물을 데우게.”
재당숙모의 말소리 끝에 아기 울음소리가 묻어 나온 듯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포탄이 하늘을 찢는 소리와 함께 날아갔기 때문에 거기 묻혀 버렸다.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근처에 쪼그려 앉아 끊어진 미투리 끈을 고치고 있던 열다섯 살짜리 장남과 열 살짜리 차남이 산파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장 주부는 손가락을 까딱까딱해 아이들을 불렀다. 두 아들이 걸어오자 움막 앞에 진흙을 이겨 만들어 놓은 화덕을 가리켰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제물포 세창양행(世昌洋行)에서 만들었다는 성냥을 꺼내 주었다. 아들을 또 하나 낳았지만 썩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놈의 포성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다 자란 두 아들은 이미 오전에 화덕의 무쇠 솥에 물을 길어다 부은 터였고, 아비의 뜻을 척척 헤아려 솔잎 쏘시개와 소나무 삭정이를 적당히 아궁이에 넣었다. 장남이 황홍색의 마른 솔잎에 성냥불을 붙였고 차남은 그것을 화목 밑에 넣은 뒤 무릎을 꿇고 눈이 토끼처럼 빨개지도록 후후 불었다.
불길이 아궁이 밖으로까지 춤추듯이 활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장 주부는 다시 포성에 귀를 기울였다. 작년 이맘때 일이 떠올랐다.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 그런데 그런 기억은 왜 잊히지 않고 새록새록 살아오는 것일까.
지난해 5월, 조선반도에 상륙한 일본군은 북상하면서 하장동을 거쳐 올라갔다. 용암포(龍巖浦) 주둔 러시아 군이 어딘가로 빠져나가 진을 치고 있다더니 그들과 한 판 붙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려 길이 질척질척했는데 일본군은 마을 사람들을 사냥하듯이 붙잡아 포차와 치중(輜重)마차를 밀게 했다. 그는 내일 모내기를 하려고 무논 못자리에서 모를 뽑다가 끌려갔다. 포차 바퀴가 진창에 빠지자 일본군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발길질하고 총 개머리판으로 찍었다. 그도 정강이를 군홧발에 찍혔는데 퉁퉁 부어, 일본군에서 풀려난 뒤에도 몇 달을 고생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용천에서 싸움이 붙은 것이다.
화덕에서 데운 물을 큰 바가지에 담아 산모가 있는 움막 안으로 들여보낸 뒤에도 포성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해가 저물 무렵에 포성은 더 커지고 많아졌다. 장 주부는 재당숙모가 작은 바가지에 담아 주는 태(胎)를 받아들었다. 사위에서 어둠이 포위하듯 다가오고 있었다. 나흘 전 피난 떠나오며 짐 속에 넣어 온, 자루 짧은 괭이로 땅을 파고 태를 묻었다.
냉기와 비와 이슬을 겨우 피하게 만든 움막. 움막 안이 이미 어두워 그는 토벽의 움푹 팬 자리에 놓인 고콜불1) 빛 속에 아기의 얼굴을 보았다. 마흔이 넘은 어미에게서 나온 노산(老産)인데도 아기는 몸이 컸다. 우는 소리도 우렁찼다.
“딸년 하나 바랐더니 또 아들이 나왔네. 그런데 고놈 기골이 참 크군.”
그는 까부라진 모습으로 누워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음날 포성은 그쳤고 무사히 사나흘이 지나갔다. 5일장이 열리는 열나흗날, 용암포 장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듣고 온 소식에 의하면 전쟁은 결국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다고 했다.
“아라사 군은 수천 명이 죽어 형편없이 박살나 버렸고 용암포의 아라사 군대 기지도 왜놈들이 차지해 버렸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러시아 군이 용암포를 점령한 것은 지난해 4월이었다. 만주의 마적(馬賊)들을 매수해 앞장세우고 쳐들어왔는데 닥치는 대로 민가를 습격해 약탈하고 여자들을 겁탈했다. 그는 용암포의 저자에 갔다가 보았다. 말을 탄 러시아 코사크 기병대 병사들이 처녀들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헛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딸을 구하려고 달려들던 어떤 처녀의 아버지가 코사크 병정이 쏜 총탄을 가슴 한복판에 맞아 죽는 것을. 이제는 그 역할을 왜놈들이 할 것이었다. 그런 불안한 예감에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산골짜기 움막에서 이레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기와 산모는 술독을 싸듯 솜이불로 둘둘 싸서 수레에 싣고 갔다. 이 아기가 바로 뒷날 민족의 운명을 가슴에 안고 투쟁한 독립투사이자 혁명가, 본명보다는 김산(金山)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장지락(張志樂)이다.
장지락이 출생한 1905년은 조선인들에게 가장 불운한 해였다. 이미 나라의 운명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결국은 일본의 침탈 야욕 앞에 무릎을 꿇어 버렸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일본은 이 나라가 이미 자기들의 것인 양 더 당당하고 교만해졌다. 고종황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밀사를 보내 독립 청원을 전달했으나 외면당했으며, 친일파 모임인 일진회(一進會)로부터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라는 협박을 받았다. 11월 7일, 마침내 제2차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니 그것이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이었다.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이 조약의 폐기를 상소했으나 황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장지연(張志淵)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사설을 써서 민족의 울분을 일으키게 했고 시종무관장 민영환(閔泳煥)과 전 의정(議政) 조병세(趙秉世)가 자결했으나 모두 덧없는 일이었다.
한반도 서북단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용천군은 국경이 지척이라 늘 변경(邊境)으로 남아 있었다. 평안도 땅이 대개 그렇듯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을 갖고 있었다. 인접한 의주군에서 강남(江南)산맥의 한 활기가 다리를 뻗듯이 뻗쳐와 표고 477m의 용골산을 만들었지만 높은 산은 군 전체에 그것뿐이었다. 그래서 ‘서북 사람들은 강인하고 드세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용천 사람들은 인심이 순후한 편이었다. 특히 서해에서 가까운 곳, 곡창지대 사람들은 더욱 그러했다.
용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용암포였다. 압록강 하구에 있는 이 포구는 군(郡)소재지에서 30리쯤 떨어져 있으나 러시아의 불법 점령 이후 크게 번창했다. 이곳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날카로워지고 러일전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쟁은 제물포 항구의 해전과 여순(旅順)항의 전투로 시작되었지만 평안북도, 특히 용천군 일대가 승패를 가르는 전쟁터로 바뀌었다.
왕조시대에는 서북 출신을 관직에 등용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로 인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 차별은 더 강화되었지만 나라가 일본의 위협을 받으며 누란의 위기에 처하자 서북인들은 조상들이 그랬듯이 분연히 일어나 구국의 횃불을 들었다. 그것 중 하나가 옥산재(玉山齋)였다. 을미년(1895년)에 일본 무뢰배들의 왕비 시해가 일어나자 토왜보국(討倭保國)을 외치며 의병을 일으켰던 유림의 거두 유인석(柳麟錫)이 힘이 다해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들어간 것은 1896년이었고 다시 고국 땅을 밟은 것은 1900년이었다. 이 무렵에 용천의 선각자들은 옥산재를 만들어 그를 초빙하고 이곳을 중요한 의병투쟁의 근거지로 만들어 나갔다. 이런 과정에서 옥산재에서 의병장 전덕원(全德元)이 배출되었다. 그는 유인석의 명을 받들어 각 나라 공사(公使)에게 격문을 보냈다. 그리고 의병을 일으켜 항전하다가 체포되어 황주(黃州)에 유배되었으나 탈출해 만주로 망명했다. 용천 사람들은 변경인(邊境人)으로서 차별을 받아왔지만 그렇게 조국이 위기에 처하면 애국혼을 불태웠다.
장지락의 집은 평안북도 용천군 북중면 하장동 289번지에 있었다. 아리랑의 노래2)는 그의 고향을 평양 교외 차산리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930년 북경(北京)3)에서 중국 국민당 공안국에 1차로 체포되어 일본인들에게 넘겨진 뒤 천진(天津) 일본영사관에서 찍은 사진의 앞가슴에 걸고 있는 판때기에 이 주소가 적혀 있다.4) 탁월한 전기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리랑의 노래는 왜 그의 고향마을을 잘못 썼을까. 그 책의 내용은 이제 와서 중국 근대사 연표와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정확하다. 저자인 헬렌 포스터 스노5)는 장지락 개인 신상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일부러 틀리게 기술했다. 원고가 국민당 공안국이나 일본군에 넘어갈 경우 그에게 닥칠 위험을 염려한 까닭이었다. 그녀는 초고에 그의 모국을 몽골이라고 썼었다. 뒷날(1981년) 그의 아들 고영광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서북의 곡창이라는 용천평야의 한가운데 위치한 하장동. 70여 가구의 집들이 남향으로 옹기종기 앉아 있었다. 사방을 휘휘 둘러보아도 벌판이었다. 산이라고는 북동쪽 10리의 덕봉산, 남쪽 30리에 용골산이 보일 뿐이었다. 마을 안에는 겨우 어른 키로 두 길쯤 되는 둔덕, 소나무 가득한 구릉이 있을 뿐이었다. 마을 앞으로 나서면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용골산까지는 거침없이 펼쳐진 들판. 그 가운데로 장천(長川)이라고 부르는, 강보다는 작고 시내라고 부르기에는 큰 하천이 뱀처럼 구불구불 지나갔다. 가뭄에는 걸핏하면 말라버려 사람들의 애를 태우게 하지만 농사짓기에는 그런 대로 좋았다. 마을 뒤편에는 뽕나무밭이 있었다. 토질이 좋아 잎사귀에 윤기가 났으며, 그래서 누에치기가 알맞은 부업이 되었다. 마을의 모습은 인근 마을과 다를 것이 없었으나 사람들은 대개 밥을 굶지 않았으며 몸에 궁기가 들지 않았다.6)
용천군지(龍川郡誌)는 하장동의 저명한 지형지물로, 마을 앞에 펼쳐진 무논지대를 관통해 나가는 ‘대정(大正)수리조합’ 수로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 땅이 비옥해 마을의 경제형편이 넉넉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정수리조합 수로가 완성된 것은 1918년이므로 그가 태어났을 때는 벌판이 장천에 흐르는 물에 의지하는 천수답이었을 것이다.
하장동에서는 용암포가 10리쯤 거리에 있었으며 4일과 9일에 장이 열렸다. 하장동 마을의 물산은 거의 쌀뿐인지라 마을 사람들은 생활필수품을 사기 위해 한 해 72회 열리는 용암포 5일장에 수십 명이 나가곤 했다. 그리고 아이들도 거기 있는 학교에 다녔다. 그래서 용암포가 개항한 뒤에는 저절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빠르게 마을에 전해졌다.
동녘 판 아리랑은 장지락이 러일전쟁을 피해 산 속에 있을 때 태어났다고 기술했으나 지명은 안 나와 있다. 그 곳은 덕봉산이 거의 확실하다. 용천군 북중면은 용천평야 가운데 위치한다. 사방이 지평선만 보이는 평지여서 산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다. 하장동에서 살다가 월남한 분들은 하장동에서는 도무지 전란을 피할 곳이라고는 이 산밖에 없다고 말한다.6)
그의 본명은 오랫동안 장지락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1998년, 그가 1931년에 천진의 일본 영사관에서 죄수 차림으로 찍은 사진이 발굴 공개되었다.6) 거기에 이름이 장지학(張志鶴)으로 쓰여 있다. 가명들도 여러 개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장지락’도 있어 그것도 가명 중 하나였을 것임을 짐작하게 해 준다. 사진 자료를 공개한 백선기와 홍정선은 덧붙인 글에서 ‘고향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만간 심문을 받게 될 그가, 금방 들통날 일인데도 장지학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을까? 아리랑의 노래에는 일본영사관에서, 조선총독부에서 보내온 기록을 포함해서 수많은 서류를 펼쳐놓고 그의 이름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그가 이름을 속일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보다는 고향에서 사용한 본명은 장지학이고 중국에서 사용한 모든 이름이 가명인 것은 아닐까?’라고 했다. 그 견해처럼 그의 호적상 이름은 장지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북경 살인사건’에 대한 해명으로 조선일보사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보낸 자필 편지6)에 장지락이라고 썼고, 일본 관헌자료들과 헬렌 포스터 스노의 인터뷰 노트, 형제처럼 가까웠던 동지 김성숙(金星淑)이 회고록7)에서 아무 다른 언급 없이 그 이름을 사용했고, 그와 정식 결혼한 중국인 아내 조아평(趙亞平)이 그의 이름을 끝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리랑 출간 이후 우리에게 그것이 친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그의 이름은 호적명과 다르더라도 장지락으로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
장지락은 지하활동을 하면서 열 개가 넘는 많은 가명을 썼다. 장북성(張北星), 장북신(張北辰), 장명(張明), 유청화(劉淸華), 유금명(劉錦明), 유금한(劉錦漢), 유한산(劉寒山), 유한평(劉漢平), 한국유(韓國劉), 유자재(柳子才), 이철암(李鐵庵), 우치화(于致和), 손명구(孫明九), 김산 등이었다. 그리고 북성(北星), 염광(炎光), 황야(荒野) 등의 필명도 사용했다. 이 가명과 필명 들은 그가 마르크스시트이며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은연 중 드러내고 있다. 김산이라는 마지막 가명은 1937년 헬렌 포스터 스노와 인터뷰하며 만든 것이다. 많은 가명들 중 중국공산당 조직에서의 대표적인 이름은 장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쉽지만 그의 부모형제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다. 4남 1녀였으며 넷째 이름이 장지홍(張志洪)이었다는 사실만이 그의 아내 조아평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조아평은 뒷날 1932년 그가 고향집으로 편지를 보냈고 그 답장이 넷째인 장지홍의 이름으로 왔음을 회상하였다.8) 아리랑에 형제들의 이름이 없는 것 역시 그의 신분을 숨기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시기에 월남한 용천 출신 인사들은 1968년에 용천지를, 1998년에는 용천군지를 발간했다. 그러나 두 책에는 독립투사 장지락에 대한 단 하나의 정보도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동 장씨 용천파들은 월남한 뒤에 족보를 부활시켰는데, 아쉽게도 월남한 가계만 넣고 북한에 남은 가계는 빼버렸다. 그것에는 장지락도 장지학도 장지홍도 없다.
오랫동안 장지락에 관련 비밀자료를 발굴해온 북경 중국 중앙공산당학교의 최용수 교수는 그가 중국 경찰에 체포당해 작성한 자술서를 입수 공개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의 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아리랑에는 그가 신의주 경찰서로 넘겨져 심문을 받으며 부모형제 이름, 그동안 만난 사람들, 보통학교 선생님들까지 샅샅이 물어 대답해야 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 심문조서를 찾거나 용천군의 옛 호적부를 열람한다면 그의 가계에 대한 궁금증이 풀릴 것이다.
가출한 수재
장지락은 별 탈 없이 자랐다. 그가 아직 어렸을 때 큰형이 결혼해 아이들을 낳으면서 식구가 늘어났다. 형수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시집 와서도 예배당에 다녔다. 며느리의 영향을 받아선지 어머니도 예배당에 다녔다. 인근 마을 추정동(秋亭洞)에 초가집으로 된 작은 교회가 있었다.8)
집은 방 두 개와 광 셋, 그리고 헛간이 있는, 당시로서는 보통 규모의 북방식 초가집이었다. 큰형네 식구가 늘어나면서 늘 복작거렸다. 그래서 작은형은 여름이면 누에를 치는 헛간에서 잠을 잤다. 큰형은 마을의 서당을 다녔지만 작은형은 1906년에 개교한 용암포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
큰형이 무뚝뚝하고 권위적인데 비해 작은형은 성정이 부드럽고 착했다. 늘 어린동생을 업어 주기를 좋아했으며 동무들과 놀 때도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동생이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심심풀이로 숫자와 셈을 가르쳤다. 어린 동생이 척척 해내자 한글과 자신이 아는 한자들을 가르쳤다.
“얘는 수재예요. 뭐든지 금방 알아들어요.”
작은형은 부모와 큰형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막내의 총명함에 크게 기뻐하였지만 아버지와 큰형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버지는 농토 1정보를 가진 자작농이었고 누에도 쳤지만 빚을 지고 허덕거렸다.8) 큰형은 제 처자식이 여럿 딸린데다가 사업을 일으켜보려는 야심이 커서, 어린 막내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는 마을 앞 드넓은 들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정수리조합 수로 공사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 뒤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신작로를 놓으려고 측량 기사들이 다녀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마을 앞 들판이 장차 수리안전답으로 바뀔 때에 대비해 기계방아를 사서 정미업을 해보자는 계산을 갖고 있었다.
지락은 어머니 손을 잡고 추정동 교회에 나갔다. 성경책을 척척 읽었다. 목사가 놀라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보통아이들과 다른 명석한 두뇌를 가진 아이입니다.”
가족과 주변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총명하다는 평을 받으면서 자랐다.
나라가 일본에 강제 합병된 1910년 8월 29일, 온 마을 사람들이 대성통곡했다. 영문을 몰라 눈을 깜박이는 지락에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해 주었다.
“나라가 망했단다. 일본에 우리나라를 빼앗겼단다.”
지락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엉엉 울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매우 슬픈 일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무렵,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의 ‘거국가(去國歌)’가 떠돌고 있었다. 도산이 강제합병 직전 체포를 피해 황해도 장연(長淵)에서 소금 배를 타고 청나라로 탈출하며 남긴 노래였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었노라
까불대는 이 시운이
나의 등을 내밀어서
너를 떠나가게 하니
간다 한들 영 갈쏘냐.
나의 사랑 한반도야.8)
어린 지락은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과 놀았다.
나라가 망한 것이 슬픈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눈으로 확인한 건 다음해 봄에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다. 어느 날, 허리에 칼을 찬 일본인 순사들이 대문을 걷어차 열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주먹으로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어린 지락은 울부짖으며 순사들에게 달려들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다. 어머니가 맞은 것은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명령이 있었는데도 맞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락은 그때 일본 사람을 처음 보았는데, 어머니에게 주먹질하는 모습은 잊지 못할 유년의 기억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지락은 다음해 여덟 살이 되었고 봄에 용암포공립보통학교에 들어갔다. 하장동에서 학교까지는 10리가 조금 넘는 거리였다. 또래 아이들은 매일 걸어 다니기가 힘에 부쳤지만 지락은 거뜬하게 걸어 다녔고 다리가 튼튼해졌다.
어느 날, 지락은 학교가 파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 5일장이 열리고 있던 용암포의 저자로 갔다. 장 구경도 하고, 장을 보고 돌아가는 마을사람들을 만나 우마차나 달구지를 얻어 타기 위해서였다.
사람이 가득한 저자의 한복판, 남사당패가 연희(演戱)를 하고 있었다. 지락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 옆구리 사이로 머리를 디밀고 구경했다. 그 때 갑자기 이마에 붉은색 헝겊 띠를 맨 남자 하나가 우마차 위에 서서 두툼한 전단 뭉치를 허공을 향해 던져 흩뿌렸다. 그리고는 두꺼운 기름종이로 만든 나팔통을 입에 대고 벽력같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서간도에서 온 의병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보다 불쌍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섬 오랑캐의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서북인의 정신은 구부러들지 않고 꺾이는 데 있습니다. 나라 찾는 일에 분연히 일어서십시오!”
그러고는 흰 광목을 펴놓고 무명지를 깨물어 ‘조선독립만세’라는 여섯 글자를 혈서로 썼다.
“언제 일어선단 말이오?”하고 장꾼 한 사람이 물었다.
“곧 때가 옵니다. 그때는 민족 전부가 일어서야 합니다.”
청년이 혈서 쓴 광목 양끝을 잡아 머리 위에 올리며 외쳤다.
“당신은 어느 의병단에 속해 있소이까?”
다른 장꾼이 물었다.
“나는 이동휘(李東輝) 장군 부하로 강화 진위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군을 모시고 간도에서 독립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동휘 장군에 대해 아시지요? 아전(衙前)의 몸으로서 탐관오리인 사또에게 불화로를 뒤집어씌우고 탈출해, 역시 평민 출신인 이용익(李容翊) 어른의 보호로 처벌 받지 않고 무관학교에 들어가 졸업했고 특별왕명을 받아 암행서사가 되어 부패한 관장 열네 명의 목을 자른 의로운 분, 강회 진위대장으로서 분연히 일어나 의병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 때 어디선가 휘익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동패 하나가 숨어 있다가 위험신호를 한 것이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조국 독립만이 민족의 살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동휘 장군의 이름을!”
간도에서 온 남자는 붉은 헝겊 띠를 풀고 민첩하게 사람들 속으로 묻혀 버렸다. 저자를 순찰하던 헌병 경찰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달려와 눈을 부릅뜨고 두리번거렸지만 이때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은 어린 장지락에게 인상 깊은 장면으로 기억되었다. 지난해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거의 죽도록 어머니가 일본 관리에게 매를 맞은 장면처럼. 그리고 그는 붉은 헝겊의 이마 띠를 맨 남자가 잊지 말라고 말한 이동휘 장군의 이름을 저절로 외게 되었다.
이 무렵, 집안에 변화가 생겼다. 큰형이 농사일도 하면서 작은 정미소를 만들어 경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과는 시원치 않았다. 인근 마을에 첩을 두었고 자신의 처자식은 집에 팽개쳐 두고 첩의 집에 가서 살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빚에 몰리면서도 술을 많이 마셨다. 집에 들어와서는 트집을 잡아 차남과 지락에게 매질을 했다.
아버지는 걸핏하면 차남과 지락의 머리를 주먹으로 툭 쥐어박으면서 소리쳤다.
“웬수같은 놈들아, 꼴도 보기 싫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 화나셨다. 맞지 말고 도망가라.”
작은형은 얼른 도망쳤지만 지락은 꼿꼿이 서서 맞으며 저항했다.
“아버지가 낳아 놓고 왜 때려요?”
그래서 더 얻어맞았다.
작은형은 보통학교 졸업 후 집에서 농사를 거들고 누에를 쳤으나 끝내는 아버지와 큰형에 반발해 돈을 훔쳐 가출해 경성까지 걸어서 갔다.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이제부터 그놈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여 소리쳤다.
작은형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길을 열어 나갔다. 상업학교에 다니면서 일본인 양화점의 점원으로 일하다가 도제(徒弟)가 되었다. 구두 재봉틀 기술을 익히려고 밤잠을 안 자며 애를 썼다.
1916년, 장지락은 열두 살로 보통학교 졸업반이 되었다. 성적은 좋았지만 생활은 성실하지 못했다. 자주 아이들과 싸움을 벌였다. 키가 큰 편이었지만 텃세를 하는 용암포 아이들을 상대로 악착같이 싸워 이겼다. 그가 이렇게 변한 것은 옆에 작은형이 없고 아버지와 큰형이 만날 때마다 야단만 치고 매질을 하기 때문이었다.
한중국경이 가까운 터라 이따금 독립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비밀스럽게 돌았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소곤소곤 말했다.
“이틀 전 독립군 열 명이 쳐들어와서 일본 놈 여섯을 죽였대. 독립군은 하나만 죽었고 나머지는 압록강을 건너 사라졌대.”
다른 아이가 비밀을 지키라고 다짐하고 독립군인 자기 형 이야기를 했다.
“그저께 형이 집에 와서 묵었어. 군자금을 모금하러 왔대. 다섯 명의 동지들과 함께 평양 근처까지 가서 보초 놈들을 쏴 죽였대. 논 속에 숨어 버려 왜놈 수색대가 찾지 못했대.”
또 다른 아이가 입을 열었다.
“우리 사촌형은 서간도 신흥학교에 들어갔대. 학비 안 받고, 왜놈들하고 싸울 군사교육을 시켜 주는데 압록강 건너면 멀지 않은 곳에 있대.”
장지락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다. 언젠가 용암포 저자에서 본 의병대원의 날카로운 눈빛과 그의 대장이라는 이동휘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은 언제 싸웠냐는 듯 어깨동무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락은 한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바로 이틀 전 깊은 밤에 아버지가 누구를 만난 일 때문이었다. 전 날 덜 익은 참외를 먹고 배탈이 나서 뒷간에 다녀 올 때였다. 아버지가 어두운 담벼락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내놓겠다는 거군요.”
“그렇소.”
“좋소이다. 대신 비밀은 지키시오. 발설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거요.”
그리고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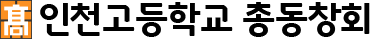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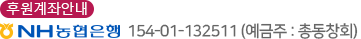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