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원규(65회)가 [학산문학]에 쓴 권두언
본문
[학산문학] 기고
권두언
문학은 삭막한 세상을 적시는 정신의 우물
이 원 규/소설가. 동국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오늘 서재의 창으로 스며드는 햇볕을 받으며, 야싸 하이페츠가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을 들었습니다. 문득 머리에 영국의 대문호 버나드 쇼와 하이페츠의 교유(交遊)에 관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1930년대 말, 버나드 쇼는 미국에 갔다가 카네기홀에서 신성(新星)처럼 떠오르고 있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하이페츠의 공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 그대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구나 하는 경이로움도 있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알게 하는 연주, 그리고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혼신의 연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득, 저러다가는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요절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버나드 쇼는 연주회 다음날 하이페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친애하는 하이페츠 선생, 나는 당신의 연주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당신의 연주는 예 술혼이 치열하게 살아 있었으며 엄숙하고 고귀한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율과도 같은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것은 비록 가는 길은 다르지만 예술에 몸 바친 한 선배로서 갖게 되는 걱정 때문입니다. 한 번의 연주회를 위하여 그렇게 심신을 소모하면 당신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이페츠 선생, 소비에트에서 망명한 당신은 올해 서른 살인가요, 아니면 서른한 살인가요? 나는 당신이 크라이슬러를 넘어서는 위대한 거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당신이 걸어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예술의 진정한 완성을 위하여 그 길을 차근차근 걸으려면 힘을 아껴야 합니다.
편지를 읽은 하이페츠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대문호인 버나드 쇼의 간곡한 충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답신을 보냈고 버나드 쇼가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교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때문인지 몰라도 하이페츠는 ‘20세기 최고의 거장이며 아무도 꿈꾸지 못할 신에 가까운 능력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로’라는 평가를 들으며 86년의 장수를 했고 83세까지 연주를 했습니다.
하이페츠가 세상을 떠나던 1987년에 이 일화를 처음 어느 책에서 읽었을 때 나는 가슴속에 하나의 묵직한 화두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술은 혼신의 힘을 다해도 완성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많은 천재 예술가들이 빛나는 작품을 만들고 요절한 게 아닌가. 대략 그런 생각이 가슴속을 메웠습니다. 사실 보통의 시인 작가들은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처절한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소설가의 경우는 생명과 건강의 한계선을 만져보곤 합니다. ‘나는 지쳤다. 내가 여기서 한 줄을 더 쓴다면 나는 처자를 남겨두고 죽을 것이다’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매달리곤 합니다. 그렇게 전력투구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 놓고는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걸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면서 작품을 내놓게 됩니다.
짧고 굵게 빛나는 작품을 만들고 말 것이냐. 자신의 역량을 조절하고 작가 수명을 길게 연장할 것이냐. 나는 80세가 넘도록 작품 활동을 한 버나드 쇼와 하이페츠를 생각하며 나 자신의 힘과 호흡을 조절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게을러져서 옛날처럼 많은 작품을 생산하지 못하지만 늘 두 사람의 일화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연히 들은 음악이 하이페츠의 연주라는 사실만으로 그 화두를 다시 안은 것입니다.
그리고 버나드 쇼와 하이페츠의 일화가 준 그 화두는 또다른 상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문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회의 말입니다. 나를 문단에 나가게 해준 한국의 대표적인 문예지, [현대문학]은 20년 전에 비해 발행부수가 1/20로 줄었습니다. 10년 전 만해도 웬만한 작가가 10편의 단편소설을 가진 걸 알면 출판사들이 출간을 요청했지만 지금은 잘 나가는 작가들 몇 사람을 빼면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무슨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빼면 창작집은 거의 팔리지 않고 장편소설도 여간해서는 발간부수가 만부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정통한 시와 소설은 대중예술과 인터넷과 영상매체에 밀려 향수자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인 작가들은 자기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왜 소설을 쓰는가. 심리적인 대리 충족을 위한 게 아닌가. 혹은 현실 세계에서 내가 만든 가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심하며 소설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왜 쓰는가. 누구를 위하여 쓰는가.
그렇다면 시와 소설이 패망의 골짜기에 굴러 떨어지고 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90년대 말 이른바 IMF 구제금융의 시기에 신춘문예 응모자들이 그 전보다 30~40퍼센트 늘어났고, 그 뒤 몇 년 줄어들었던 응모자들은 작년과 금년 다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일수록 시와 소설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문학이야말로 혼란스런 시대를 하는 밝게 하는 등불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통문학은 돈을 버는 수단, 입신출세를 위한 수단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듯합니다. 그냥 시대의 아픔을 작품에 담고 인간의 꿈을 작품에 담아 생을 풍성하게 하는 사명밖에 남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리는 작품의 생산행위는 그 엄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은 혼탁한 시대의 갈증을 풀어주는 구원하는 위안의 우물, 삭막한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우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설가 이원규와 푸른 날개 Since 2003에 가면 이원규가 쓴 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 http://cafe.daum.net/novelistlee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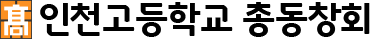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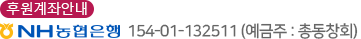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