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원규(65회)의 인천설화(3)--부평부사와 경명현의 도둑 두목
본문
부평 부사와 경명현의 도둑 두목
옛날 부평 고을에 신관 사또가 부임해왔다. 관아에서 하루를 묵고 아침을 먹으려 할 때였다. 고을의 방범 경찰 업무를 맡은 병방(兵房)이 헐레벌떡 달려 들어와 보고했다.
“나리, 털렸습니다요.”
“이놈아, 뭐가 털렸다는 것이냐. 똑바로 말해라.”
사또는 숟가락을 놓으며 낯을 찡그렸다.
“징맹이고개에서 도둑떼가 행인의 짐을 털었습니다요.”
“뭣이라구? 그 도둑놈들이 내가 부임한 첫날부터 털었단 말이냐?”
사또는 발을 구르며 벌떡 일어나 칼을 집어 들었다. 그는 기가 막혔다. 부평부사로 제수되던 날, 그는 조정으로부터 다짐을 받은 터였다. 계양산 경명현의 도둑 떼를 말끔히 토벌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열흘쯤 단단히 준비를 해서 토벌대를 이끌고 나서려던 참이었다.
“내 이놈들을 요절내고야 말겠노라.”
그는 아침 먹는 일도 거르고 여남은 명의 수행원과 함께 계양산으로 갔다.
이 산은 군도(群盜)가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인천과 부평 일대에서 가장 높고 깊은 산인데다, 수목이 무성하여 몸을 숨기기 쉬웠다. 그리고 산 아래로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부자들이 많고 빼앗을 것이 많았다.
게다가 산의 허리에 걸쳐진 경명현은 서울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충청과 호남에서 배를 타고 올라와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나 짐은 이 고개를 지나야 했다. 원창동의 환자곶 해안에 있는 정부 세곡창고에서 세곡을 서울로 싣고 가려 해도 마찬가지였다. 고개의 길이는 20리가 넘었다. 그러므로 도둑 떼가 자리잡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이 고개는 도적이 강하고 숫자가 많아 일행이 천 명이 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고 하여 ‘천명고개’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경명현의 도둑 두목은 키가 작고 날렵한 자라고 알려져 있었다. 전임사또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토벌에 나섰지만 두목의 그림자 한 번 보지 못했다고 했다.
사또도 그렇지만 조정에서 걱정하는 것은 계양산 도둑 떼의 두목이 마치 의적(義賊)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이었다. 고개에서 재물을 빼앗아서 캄캄하게 어두운 밤에 조용히 가난한 집 담장 안에 던져 놓고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도둑이 민심을 얻고 조정에서 민심을 이반하게 하는 것, 그것은 통치의 기반을 흔드는 요소였다.
사또는 경명현을 샅샅이 순찰했으나 도둑은 흔적도 없었다.
사또는 도둑에게 주는 경고장을 붙였다.
나는 조정의 명을 받아 너를 토벌하러 왔다.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으며 감히 의적인 양 하다니, 참수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수한다면 목숨만은 살려 줄 것이니 자수하 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 산 아래 나졸들을 배치하고 행인을 서른 명 또는 쉰 명으로 묶어 고개에 오르게 했다. 마을에는 청년들을 시켜 야경을 돌게 했다. 재물을 가난한 집에 던져 놓는 자를 무조건 붙잡으라는 명령도 내렸다.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다음날 아침 다시 기막힌 소식을 들었다. 그가 순찰을 끝내고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도둑이 행인들의 짐을 털었고 그것을 즉시 산 아래 마을의 가난한 집에 던져 넣었다는 것이었다.
관아로 붙잡혀 온 나졸들이 말했다.
“갑자기 주먹 만한 돌이 날아와 정신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행인들의 짐이 다 털린 뒤였습니다.”
나졸들은 이마에 돌멩이를 맞아 상처가 나고 퉁퉁 부어 있었다.
“이 미련하고 둔한 놈들아, 그래도 너희가 아전이라고 나랏밥을 먹는단 말이냐.”
사또는 화가 나서 나졸들에게 볼기를 스무 대씩 맞는 장형(杖刑)을 내렸다.
마을에서 야경을 한 청년들도 끌려와서 말했다.
“눈을 부릅뜨고 봤습니다요. 정말 바람 소리밖에 듣지 못했습니다요.”
그 청년들도 장형 10대씩을 맞고 돌아갔다.
그 사흘 뒤, 사또는 60명의 나졸과 포졸을 이끌고 징맹이고개로 갔다.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키가 작고 땅딸하게 생긴 자가 홀딱홀딱 재주를 넘으며 사또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더니 큰소리로 호통 치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사또.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말하는 투가 방자하기 짝이 없었다.
부사를 수행한 포교가 꾸짖었다.
“이 무엄한 놈, 어느 어른 앞인데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포교가 손짓하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생포하려 했다. 그러나 땅딸보 도둑은 잽싸게 몸을 날려 큰 바위 위로 사뿐 올라앉았다. 그러고는 하하하하 배꼽을 잡으며 호기롭게 웃었다.
“어리석은 것들아, 너희가 어떻게 나를 잡아? 어서 너희들 패랭이나 살펴보아라.”
포졸들이 패랭이를 벗어보니 패랭이 꼭지가 모두 잘려 땅에 떨어져 있었다. 포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또는 큰소리로 외쳤다.
“어서 저놈을 잡아라.”
포졸과 나졸들이 마지못해 칼을 뽑아들고 나섰으나 당할 수가 없었다. 도둑은 포졸과 나졸들의 절반 정도 인원이었으나 이리저리 휙휙 날아다니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포졸과 나졸들은 뒤통수와 어깨를 얻어맞고 쓰러졌다. 사또 혼자만 얻어맞지 않고 온전했다.
사또는 체면이 잔뜩 구겼으나 칼을 뽑아들었다.
“땅딸보 두목놈아, 어서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땅딸보 두목은 아까처럼 훌떡훌떡 재주를 넘으며 나타났다. 그러더니 거꾸로 물구나무를 선 채 외쳤다.
“사또, 혼자 남았는데 어쩌시려구요. 정말 망신당하기 전에 돌아가시오.”
그러더니 허리춤에서 표검을 뽑아 휙휙 던졌다. 표검들은 사또 곁에 있는 키큰 소나무 둥치에 탁탁탁 소리를 내며 연속적으로 꽂혔다. 부하들은 다 쓰러졌고, 도둑은 한 놈도 잡지 못했고, 표검은 무섭게 날아와 꽂히니 어찌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사또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관아로 내려왔다.
계양산 경명현은 옛날부터 도둑떼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꺽정에도 이 고개는 등장한다. 계양산의 군도를 토벌하려다가 실패한 사또는 1560년(명종 15) 부평도호부 부사로 부임한 신건(申健)이라고 기록은 전한다.
경명현 고갯길은 1930년대까지 서해 포구에서 부평으로 가는 유효한 기능을 가졌다. 그러나 서곶로가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뚫리고, 가정동에서 부평으로 가는 안아지길이 자동차 도로로 확장된 뒤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옛 고갯길 옆으로 계양산 관통도로가 뚫리면서 기능이 다시 살아났다.
계산동의 계양산 서록에서 시작해서 계양산 기슭을 스치면서 서해 쪽으로 뻗어나간 그 길은 지금 부천과 인천의 북부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주통로가 되어 차량 통행으로 항상 붐빈다.
이원규와 푸른 날개 Since 2003에 가면 이원규의 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novelistlee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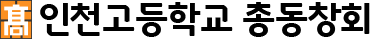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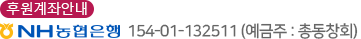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