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오광철(53회)의 전망차/왕겨 이야기(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09.12.21)
오광철의 전망차/
왕겨 이야기
지난 18일자 본지에 김윤식 시인의 ‘인천 재발견’에 ‘왕겨’ 이야기가 실렸다. 왕겨란 벼를 도정한 후 나온 껍질이다. 곡식의 껍질을 ‘겨’라고 하는데 벼의 경우 그것이 굵어 흔히 왕겨라고 했다. 우리 속담에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거나 ‘양반은 얼어죽어도 겻불은 쬐지 않는다’의 겨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예전엔 인천시민의 요긴한 연료였다.
그것을 쌀자루에 담아 사다가 밥을 짓고 겨울이면 난방을 했다. 거기에는 풍구가 있어 바람을 내야 화력이 좋았다. 손잡이로 돌려 바람을 내는 풍구에 연결된 철관과 철판을 아궁이 안에 디밀고 그위에 불붙여 겨를 조금씩 뿌려 태웠다. 왕겨는 신흥동 정미소 인근에서 사왔다. 해방을 전후 옛 도립병원 일대에는 규모있는 정미소가 많았다.
옛 그림엽서에 보이지만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는 일본인의 가또(加藤)정미소는 지금 연안부두로 나가는 교차로 삼미아파트 자리에 있었다. 그 건너편에 해방 후 명칭을 바꾼 고려정미소 그리고 유동 삼거리에서 들어오는 좁은길 좌우에도 몇몇 정미소가 있었다. 1973년판 ‘인천시사’에 의하면 1932년 공장수 12곳에서 생산능력은 현미와 백미 등 9천800석이던 것이 1938년에는 32곳에 하루 생산능력 1만5천석이었다고 한다. 우리 농산물이 일본으로 반출되면서 미곡집산지화하고 자연히 인천은 정미업이 발달했다.
그곳에서는 한국인 부녀자들이 선미(選米)작업을 하느라 혹사당했다. 신태범 박사는 ‘인천한세기’에서 싸리재사거리에서 시작하는 ‘긴담모퉁이’ 길이 정미소를 다니던 그녀들의 출퇴근길이었다고 했거니와 일인들의 노동력 착취에서 헤어나려는 분노가 종종 노동쟁의로 번져 이슈가 되기도 했었다. 30년대 그때 처치곤란이던 왕겨가 값싼 연료로 살림에 보탬이 되고 일제말에는 식량증산용 비료로 쓰였다. 고구마를 심느라 학교 교정을 파헤치고 어린 학생들을 동원, 정미소에서 왕겨를 퍼날랐다. 까마득하게 잊었던 왕겨 이야기를 읽으며 옛일을 추억한다. 지금은 왕겨를 어디에 이용할까.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9-12-20 17:3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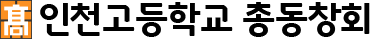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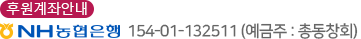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