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경호(67회) CEO칼럼/낙엽 단상(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일보(10.12. 7)
CEO칼럼
낙엽 단상
/이경호 영림목재 대표
 |
||
예년보다 높았던 기온과 많은 강우량의 영향으로 10여일 늦게 설악산과 오대산 정상에서부터 다가왔던 단풍의 화려했던 모습도 이젠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가을단풍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요인은 기온 차이 즉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야하고 일사량이 많아야 하며 청명한 날씨 가운데 영하로 내려가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기온이 차야한다. 특히 붉은 색을 띠는 안토시아닌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범위에서 온도가 서서히 하강하면서 가을햇빛이 비칠 때 가장 색채가 좋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지도 않은 알맞은 습도를 유지해야지만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다.
안토시아닌의 역할은 그 스스로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강한 햇빛으로 인한 세포파괴를 일으키는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시켜 잎의 노화를 늦추는 것이다. 또 나뭇잎에는 녹색의 엽록소외에도 빛을 흡수하는 색소로 70여종의 카로티노이드가 있다. 이들 중 붉은 색을 띠는 것이 카로틴이고 노란색을 띠는 것이 크산토필이라는 색소이다. 이들 색소는 잎이 왕성하게 일을 하는 여름에는 많은 양의 엽록소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차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잎에서 엽록소가 분해돼 사라짐으로써 이들 색소가 눈에 띄게 되는 것이다.
이들 색소의 분포에 따라 단색에서부터 혼합된 색의 단풍이 든 잎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라 한다. 특히 단풍나무의 경우 가을에는 줄기와 잎자루 사이에서 코르크층이 만들어지는데 이 코르크층은 잎에서 광합성으로 생성된 당류가 줄기와 뿌리로 운반되는 것을 방해해 잎에 쌓이게 한다. 이 당류가 잎에서 분해되면서 빨간 색소가 만들어져 세포액에 저장됨으로써 타는 것 같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단풍이 든다고 말하고 있지만 색소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엽록소가 빠지면서 녹색을 잃고서 울긋불긋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단풍은 낙엽수종이 주로 만드는데 한국은 단풍을 만드는 나무의 종류가 많아서 가을이 되면 금수강산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며, 단풍은 산마루부터 시작해서 계곡으로 내려오고 북쪽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한랭한 기온 변화의 차례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아름다웠던 단풍도 잎의 수명에 의해, 일정한 생리적 주기에 이르면 잎의 양분이 줄기 쪽으로 옮겨가 엽록체가 분해되어 녹색을 잃는데 이를 낙엽이라 칭한다. 이 현상은 생육부적기에 호흡작용이 광합성작용을 상회해 잎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양분소모가 많으므로, 잎으로부터 양분을 미리 회수하고 잎을 떨어뜨리는 편이 식물에게 유리하므로 낙엽이 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낙엽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를까? 레미 드 구르몽의 '시몬, 나무 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로 시작하는 시에서부터 트윈 폴리오의 '비오는 가을밤에…'라는 노래던가 또는 고엽의 샹송으로나 팝송도 흥얼거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다소 낭만적인 요소와는 달리 '생물의 진화론'을 통해 변화와 적응에 대해 이론을 정립한 이가 있다.
바로 그는 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으로 지난해 처음 출간된지 150주년이 되었던 '종의 기원'이라는 저서에서 "지구상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종족은, 가장 강한 종족도 아닌 가장 지적인 종족도 아닌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족이다"라고 설파했었다. 나무들이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자 월동준비를 위해 나뭇잎을 떨어뜨리면서 환경에 적응해나가는 지혜가,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은가.
2010년 12월 08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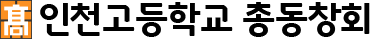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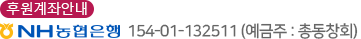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