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나채훈(65회)의 중국산책/정대공명(正大公明)과 마호주의(馬虎主義)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 1. 1)
정대공명(正大公明)과 마호주의(馬虎主義)
중국사에서 명군(名君) 셋을 꼽으라면 한고조(漢高祖) 유방, 당태종(唐太宗) 이세민, 청(淸)의 강희제로 압축된다. 이들은 통치자로서 업적도 많았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서민을 아꼈다. 은퇴하는 노재상을 송별하며 “그대는 좋겠다. 고향에서 산수(山水)를 벗하며 여생을 보낼수 있으니… 짐은 백성들이 기아에 울고 한파에 떠는 걸 생각하면 잠못이루는 밤이 많다네”하며 눈물을 뚝뚝 흘린 강희제의 일화처럼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명군들도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실패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었다. 유방은 여장부 아내 여후(呂后)의 권력욕에 걸려 뜻대로 하지 못했고, 이세민은 큰아들을 황태자로 세웠다가 배신당해 내쫓은 후 셋째아들을 후계자로 삼아 제왕학을 손수 가르치며 기대했으나 그마저 측천무후의 치마폭에 빠져 나라를 통째로 잃을 뻔했다. 강희제 역시 고초를 겪다가 겨우 숨을 돌렸다. 둘째아들을 황태자로 세웠으나 폐위시켜야 했고 다시 복위시켰다가 폐위하는 등 곡절이 있었다. 그리하여 강희제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유언에 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방법이 특이했다.
진시황의 경우를 염두에 두웠던 것이다. 그는 죽으면서 큰아들을 지목했으나 환관 조고가 바꿔치기 하여 엉뚱한 녀석이 2세 황제가 되어 나라를 거덜내고 말았다. 조고가 말(馬) 한 마리를 바치면서 “폐하 사슴을 가져 왔습니다”했다는 <마록고사馬鹿故事>가 이때의 일이다. 이후 비슷한 의미로 마호(馬虎)라는 말이 유행했다. 말이건 호랑이건 상관있느냐 까다롭게 따지지말고 그렁저렁 적당히 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느냐는 뜻이었다. 민초들의 세상에서 이런 마호주의(馬虎主義)는 그나름 부드러운 처세술이 될 수 있겠으나 국정의 최고지도부에서는 가장 경계해야할 바였다.
강희제가 입태자와 폐위,복위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후계자를 유언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황태자 주위에 꼬이는 무리들이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 뇌물을 바치거나 끼리끼리 마호주의를 즐긴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모든 황자(皇子)들이 후보자가 되기에 열심히 문무(文武)를 익히고 수기치인(修己治人)하리라는 것을 감안한 발상이었다. 그리하여 자금성의 집무처인 건청궁(乾淸宮) 옥좌 뒤에 걸려있는 <正大公明>이란 액자 후면에 후계자의 이름을 적어 금갑속에 밀봉해두는 방식을 택했다. 물론 중간에 황제의 마음이 바뀌면 고쳐 적어 넣으면 될테니 번거러움도 없었다. 마침내 강희제가 사망하고 금갑을 꺼내 열어보니 넷째 아들 윤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가 옹정제다. 옹정제 역시 이런 방식으로 후계자를 정하여 건륭제가 뒤를 이었다. 강희제 치세 61년, 옹정제 재위 14년, 건륭제의 통치 64년을 합산한 약 140년이 중국사상 태평성대의 황금기로 기록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후계자를 정해놓고 제왕학이나 권모술수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보다 자연스런 방법이기도 했다.
2011년은 바야흐로 다음 대권을 향한 출발의 해다. 내년 대선이 예전처럼 5년마다 벌어지는 득표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심기일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우선 주요 정당의 후보경선이 正大公明해야 하겠으나 당심이상으로 민심이 반영되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만큼 정치권의 마호주의를 한꺼번에 씻어 버리기 위해 공천권 등을 과감히 대선후보에게 전폭 위임해보면 어떨까. 공권력 행사의 난맥상이 끊이지 않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포기한 듯한 현실이다.
보온병이면 어떻고 포탄이면 어떠냐는 해괴한 마호주의를 정파적 이해에 따라 적당히 미봉하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광고비로 몇십만 명의 한끼 식사비를 쓰는 개그같은 마호주의, 결국 그밥에 그나물이라는 항간의 자조섞인 정치혐오를 염두에 두고 건국정신에 버금가는 결단으로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금갑이 있는 액자보다 나을것 같지 않은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정치인만 바라보기엔 속절없으면서도 절박하기에 생각해본다.
2011년 01월 01일 (토)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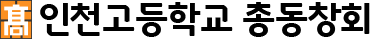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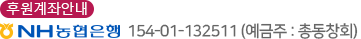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