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나채훈(65회)의 중국산책/훈채(葷菜)와 막걸리와 향육(香肉)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 5. 6)
나채훈의 중국산책/
훈채(葷菜)와 막걸리와 향육(香肉)
보양·보신의 계절이 되었다. 불허훈주입산문(不許葷酒入山門 : 훈채와 술을 먹은 사람은 절간에 들지 말라)이라는 금표(禁標)는 예전에 쉽게 볼 수 있었다. 훈채(葷菜)라 하면 마늘·파·달래·부추·생강 등 맵고 자극성 있는 채소를 뜻하는데 이를 먹으면 자극성 탓에 음욕(淫慾)이 생기고 성품을 사납게 하여 수도(修道)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리 민속에 보면 호랑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늘 냄새라 하여 무서운 밤길을 떠날 때면 마늘을 먹고 지참하기도 했었다. 당연히 전염병같은 것이 돌아도 마늘을 먹거나 문 앞에 걸어 두어 예방하려는 것이 선조들의 생각이었다. 단군신화에서 웅녀는 마늘 스무 통을 먹고 굴 속에서 고행 끝에 인간으로 변신하고 있기도 하다.
일반 가정에서도 남성의 힘이 빠져 부부관계가 여의치 않게 되면 마늘과 생강을 함께 볶아 먹었고(마늘 2∼3 조각에 생각 30g을 일주일 동안 먹었다), 부추 또한 강정 식품으로 인기가 높았다. 부추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하리(下痢)와 장염을 치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마늘이 살균력을 발휘하는 세균이 72종이 되며 임상실험 결과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마늘을 먹으면 160%까지 상승되었다고도 한다. 그야말로 훈채는 현대과학으로도 격찬받는 강정 보신식품이자 약용식품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 민족 전래의 훈채 문화가 만만세라 하겠다. 우리 술 하면 아무래도 쌀막걸리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 같다.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나오는 맛 좋기로 유명한 곡아주(曲阿酒)가 고려 여인이 빚은 술이고, 그 이전 당대(唐代)에 ‘한 잔 신라주의 기운이 / 새벽바람에 사라질까 두렵다’는 시구까지 등장한 배경을 보면 신라인의 솜씨도 좋았겠으나 기장으로 빚은 술을 맛보다가 우리 쌀로 빚은 은은하고 감칠맛 나는 막걸리 맛을 보니 별나게 와 닿았기 때문일 게다.
흔들어 탁하다고 해서 탁주(濁酒), 빛깔이 희다 해서 백주(白酒), 농사 지을 때 새참으로 마셔서 농주(農酒), 나라를 대표한다고 해서 국주(國酒) 등등으로 불린 이 술에 기분이 좋아져 산사(山寺) 주변을 어슬렁거렸다가는 치도곤을 맞아도 시인 묵객들이 쉽게 잊기는 어려웠음직하다. 오늘날 우리의 쌀막걸리가 소화를 돕고, 항암효과는 유럽에서 최고로 친다는 포도주의 수십 배 효과가 있으며 여성의 피부 미용까지 가꿔준다고 해서 역시 화제다. 이 역시 우리 전통의 술 만만세다.
훈채와 막걸리 외에 우리의 전래 보양음식에 개고기(香肉)가 있다. 속칭 ‘삼륙(三六)’이라 통하는데 중국 발음이 비슷하고 ‘3+6’의 ‘9’가 ‘구(狗)’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중국 광동 지방에서는 「삼륙경(三六經)」이라는 개고기 요리책까지 나와 보신음식으로 손꼽힌다. 그 요리책에 ‘일황(一黃) 이흑(二黑) 삼화(三花) 사백(四白)’이라 해서 개의 털 색깔에 따라 고기 맛의 등급을 매겨놓고 있다. 그러니까 황구(黃狗)가 제일이요, 검은 개(黑狗)가 그 다음이요, 얼룩 개, 흰 개 순서라는 것이다.
황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렁이다. 중국 의학의 명저로 꼽히는 「본초강목(本草綱目)」에 보면 ‘황구대보익인, 여색미보(黃狗大補益人, 余色微補 : 누렁이가 몸보신에 크게 좋으며 여타의 색깔은 효능이 별로다)’고 되어 있다. 개고기를 먹는 역사는 고대 은(殷)·주(周) 시대까지 소급되어 국가의 중요한 제사에 희생물로서 사용되어 왔고, 또한 명절에는 성문에 개를 희생하여 불행을 몰고오는 사악한 기운을 예방하기도 했었다. 중국에서 광동성을 제외하고 개고기를 많이 먹는 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주 즉 동삼성(東三省)인데 이 지역에서도 최상급품으로 치는 것이 누렁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렇듯 훈채문화(?菜文化)가 발달했고 즐겨 먹는 사실을 두고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일대를 훈채문화권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고, 개고기의 경우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거주민들 사이에 유달리 역사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어 지양육탕(地羊肉湯)이란 이름의 보신탕(補身湯)이 성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의 식품시장에서 신토불이가 아닌 훈채가 많아지고, 수입쌀 막걸리에 색깔 불명의 개고기를 보신탕으로 먹는 일이 주위에서 널려 있다 보니 때가 왔어도 안타깝다.
2011년 05월 06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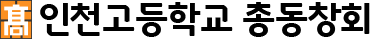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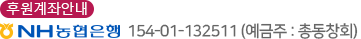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