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나채훈(65회)의 중국산책/학벌·경력이 좋다고 플러스 형은 아니다(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2. 2. 7)
나채훈의 중국산책 /
학벌·경력이 좋다고 플러스 형은 아니다
/삼국지리더십연구소장
‘밭 일에 관해 잘 아는 농부, 즉 토질에 대해, 비료에 대해, 작물 가꾸는 법을 잘 안다고 해서 농장 관리자로 반드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農精於田而不可以爲田師). 장사에 관해 소상히 알고 있으면 셈에도 능하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시장 지배인으로 앉히는 것은 적임이라 하기 어렵다(賈精於市而不可以爲市師). 직인도 세공인도 그 일에 있어서는 뛰어나다. 물건을 만들어 내는 뛰어난 솜씨가 있다 하여 공장장으로 앉히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士精於器而不可以爲器師).’ 이 말은 춘추전국시대 직하(稷下)의 제주(祭酒 : 오늘의 국립대학 총장에 해당)였던 순자(荀子)의 <해폐편(解蔽篇)>에 나오는데 오늘날 프로스포츠에서 널리 알려진 것처럼 ‘명선수가 반드시 명감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말과 상통한다.
이외에도 어떤 분야의 연구가나 숙련공이라 해서 대표성에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라는 통설은 2200년 전 순자의 지적처럼 여전히 유효하다.
순자는 이외에도 유명한 학자나 정치가의 인물 감정을 한 <비십이자(非十二子)>를 남겨 직선적인 사고로 한 면을 보고 인물을 평가하는 일은 몹시 유치한 일이며 여러 면을 고루 보고 복안적(複眼的)으로 살펴 됨됨이를 판단해야 함을 밝혔다.
① 위모와 타효라는 인물은 학문도 인격도 완성되지 못했는 데다가 교양마저 없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품임에도 그럴 듯한 근거를 만들어 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② 진중과 사추라는 인물은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나 부귀를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행동하여 대중의 추앙을 받았다. 이 두 사람은 보통 인간과 달리 속세를 떠나 고고하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잘못된 일로 대중과 함께 살아보지도 않고 대중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③ 북적과 송형은 박애로써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서 계급적 질서를 중시하고 전통과 예법을 따르라는 유가와 대립하였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하여 사상적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 형성의 원리를 잊고 공리와 검약을 주장하여 상하귀천의 구별에 혼란을 일으켰고 아는 체하는 태도가 꼴불견이라고 가혹하게 평가했다.
④ 신도와 전변은 법의 존중을 설명하면서도 실제 행동을 보면 법을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들은 저술을 통해 위로는 군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따르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를 담당하거나 사회질서 형성에 제구실을 못하는 거저 꾸며내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⑤ 자사와 맹자는 유가의 대표적인 제자로 명성을 날렸고 공자의 학설을 계승 발전시켰다는 찬사를 받았으나 그들은 오히려 공자의 기본적인 정신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속에는 큰 야심이 있어 매사에 ‘공자왈’ 하는데 이는 피상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맹렬히 비판을 가했다. ⑥ 혜시와 등석은 둘 다 명가 출신의 지식인으로 혜시는 장자의 친구이며 위나라 재상까지 지냈었고, 등석은 정나라 고관대작의 후예였다. 이 두 사람은 기상천외의 견해를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나 따지고 보면 별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변술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그들의 견해는 현실과 몹시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순자는 이들이 당대의 뛰어난 학자나 정치가 사상가로 꼽혔지만 실은 ‘사설을 꾸미고 간언을 만들어서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가차없이 평가절하하면서 인간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아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어떤 인물이 과연 우리 사회에 진정한 의미에서 플러스 되는 인간일까 하는 점에서 적어도 순자가 비판한 12명의 인물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선거공보물이나 포스터를 보면서 관상술 보듯이 하는 인간 감별법은 너무나 유치하여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평소의 모습도 아니려니와 분장술에다 포토샵에 의해 얼마든지 꾸며낸 가면적 모습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표정의 변화, 말투, 음색, 행동거지로 보는 것이 더 나을 터이고 마지막으로 더해서 판단해야 할 점은 반드시 ‘양면(兩面)이 있다’는 사실이다. 명문대학 출신에다 고위직을 지냈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플러스 형 인물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2012년 02월 07일 (화)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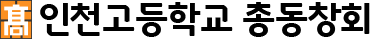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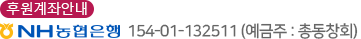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