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기문(70회) 시론/가짜 박사학위가 근절되지 않는 나라(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2. 6.25)
시론/
가짜 박사학위가 근절되지 않는 나라
/이기문 변호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을 열심히 준비하였다. 열심히 자료도 수집하고, 논문의 체제도 정비하고, 논문의 방향도 결정하였다. 그런데 막히는 것이 있었다. 결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한 달을 지내면서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달을 보내고, 결국 일 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참 많이도 지났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결국은 지금까지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 천학비재인 탓도 있겠다. 하지만 나이 먹어 논문을 작성하려고 하니, 머릿속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쓴 결론을 몇 차례 읽어보니, 다른 논문에 있는 내용을 내용적으로 변형한 것에 불과하였다. 난 그래서 지금까지 박사학위를 제출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은 아예 포기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학위논문 때문에 나라 안팎에서 난리다.
처음엔 문대성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사하갑)의 논문 표절문제로 난리를 쳤다. 이 때문에 그는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지금은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대성 당선자에 그치지 않고, 이번엔 같은 당 신경림, 염동열 당선자도 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려 있다. 신경림씨는 2004년 자신의 제자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고, 염동열 당선자는 다른 학자의 논문은 물론 대학생의 리포트까지 무단 전재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학생들이 작성한 리포트는 현재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1,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논문에 그대로 게재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논문 표절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일찍이 염상섭이 칼럼을 통해 일본의 문호 아리시마 다케오의 논문이 표절된 것이라 해서 신랄한 비판을 한 바 있기도 하다. 그는 표절행위를 허영으로 간주하고, 이와 같은 허영은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직설한 바 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4.26 부대변인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민통당의 정세균 당선자의 박사학위논문도 표절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의 진실규명과 책임있는 처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새누리당 당선자들의 논문 표절이 의혹을 받게 되자, 당차원에서 민통당의 정세균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의혹이 있다는 점을 여론에 부각하면서 ‘너나 나나 똑 같다.’는 취지의 맞불 성격의 성명을 낸 것인데, 그 동기가 역시 개운치 않다.
정치권에서 불어오고 있는 논물표절 시비가 본격적으로 각 계로 확산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각 급 대학의 교수님들은 어떨까? 이 일로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의 내부의 허영심리가 파헤쳐지고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까? 하지만 그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박사소리를 듣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박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없다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 할 수가 없다. 아니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가짜 박사학위논문이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내 머릿속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없이 남의 논문을 짜깁기해서 그것이 마치 내 자신의 창조물인양 학위논문을 제출하고, 번듯하게 박사학위를 받아내는, 허영과 잘못된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닐까?
얼마전 외국대학의 박사학위논문을 외국에 나가 직접 수학하고 작성하지 않고 국내에서 작성하여 받았다는 이유로 가짜박사파동을 겪은 바 있다. 법원에서 후일 이 문제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나기도 하였지만, 그 뒷맛이 왠지 개운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아예 이 기회에 내 자신의 양심을 뒤 돌아보자. 나에겐 그와 같은 허영심이나 외식행위는 없었는가라고 말이다.
2012년 06월 25일 (월)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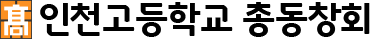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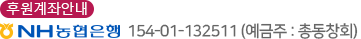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