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조우성(65회) 미추홀/그녀(彼女)(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일보(12. 8.13)
그녀(彼女)
/조우성의 미추홀 ( 915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시인, 소설가, 극작가, 비평가들은 언어를 다루며 산다. 독일철학자 하이데커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존재의 집'을 짓는 건축가들로 누구보다 예리하게 언어의 속성을 감지한다. 그 감지력은 지식으로 배운 비평적 소산이 아니라, 숙련된 미장이들처럼 몸으로 터득한 것이다.
▶196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회색 면류관의 계절'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한 소설가 윤흥길은 문학적 성과와는 관계없이 1973년에 발표한 단편 '장마', '무제'(한국문학전집 두산동아)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초기작품에서 여성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녀'를 '그니'로 하자고 제안했다.
▶한자어 '피녀(彼女)'를 우리말로 '그녀'라고 한 것이 못마땅했던 모양이다. 문장속에서 '그녀'가 주격으로 쓰일 때, 도리없이 조사 '-는'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의 음운현상이 고약하지 않냐고 언중사회(言衆社會)에 반문한 것이다.
▶'그녀는'이라고 자연스럽게 소리낼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년-', '-은'으로도 발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를 굳이 '그년'으로 발음하면 사회적 약속에 의해 '욕'이 된다. 15세기 국어에서 평상어인 '겨집(계집)'을 오늘날 욕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다.
▶그가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그니'였다. '그니는 환하게 웃었다' 식으로 하자는 것인데, 우리 고유어에서 여성을 가리키는 명사의 끝이 묘하게도 나이에 관계없이 '-니'로 끝나고 있음에 착안한 듯 보인다. '할머니', '어머니', '언니' 등이 다 '-니'자 돌림이다.
▶그러나 시인이나 소설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어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이지 어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일상어로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역사 이래로 언중들의 몫이다. 말을 쓰는 대중(言衆)이 용납하지 않으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결국 '그니'는 실험어 '그니'로 끝나고 말았다. 따듯한 어운(語韻)이나 그럴싸한 말뜻에 언중들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위험스런 '그녀'가 강세를 보인 것인데, 그에는 잠재된 언중사회의 위악적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어쨌거나 국회의원이란 자가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놓고 '년'이라고 해서 시끄럽다. '그 X'의 품격이 원래 그 수준이라면 뭐라 반문할 것인가?
/객원논설위원
2012년 08월 13일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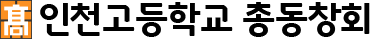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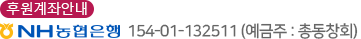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