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한·중 수교 20년 석금(昔今)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2. 8.23)
원현린 칼럼 /
한·중 수교 20년 석금(昔今)
내일이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간 수교가 체결된지 꼭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수교 체결일로부터 한 달여 뒤인 그해 9월 27일 중국 북경공항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수행원이 탄 태극마크의 특별기가 착륙했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첫 중국 방문이었다. 필자도 이 때 청와대 수행기자단의 일원으로 북경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때문에 필자에게 있어 한중수교 20주년을 맞는 심중소회는 남다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수교이후 두 나라 모두 경제가 급성장했고 앞으로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성장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국 경제교역 수치를 보면 가히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문구를 실감케 한 지난 20년이다.
수교 당시 한중 교역액은 64억 달러이던 것이 20년이 지난 2011년에는 2천206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과 인접해 있는 인천항의 대중국 교역액은 지난 1992년 14억 달러에서 2011년 548억 달러로 무려 39.1배가 증가했다는 통계다.
양국의 학계는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역사와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역사에 포함시키려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역사가 굽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국은 주변국들에 대하여 이른바 ‘삼린(三隣)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화목한 이웃(睦隣), 편안한 이웃(安隣), 잘사는 이웃(富隣)이 그것이다. 게다가 주변국 외교 정책으로 평화롭게 우뚝 일어선다는 ‘화평굴기(和平?起)’를 표방하고 나선 중국이기도 하다.
국가도 외교에 있어 신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표리가 부동해서는 안 된다. 이제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의 이 모든 외교정책이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술되어야 한다. 억지를 부린다고 역사가 달리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을 뒤집거나 비켜간 기록은 역사가 아니다. 왜곡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는 없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옛부터 광활한 영토를 지녀 자국만을 놓고도 자칭 ‘천하(天下)’라 칭해온 나라다. 역사서술의 비조(鼻祖) 사마천(司馬遷)을 배출한 나라다. 사마천은 누구인가. 한 무제의 역린(逆鱗)을 건드려 남자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한 형벌인 궁형(宮刑)에 처해지면서까지 끝까지 살아남아 ‘사기(史記)’를 완성한 사가(史家)다. 후세에 생생한 역사기록을 전해 부끄럽지 않은 사관으로 이름을 남기겠다며 춘추필법으로 사실의 역사를 기록한 불세출의 역사가가 아닌가.
역사는 반복되는가. 한 세기 전 서세동점(西勢東漸)시기, 한반도는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다. 외환(外患)을 겪은 지 1백여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밀려드는 외세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다. 내전(內戰)이 지속된 나라는 망국의 길을 걸어야 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도 최근 동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바있다. 기술한 중국의 멈추지 않는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도 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들어 주변나라들의 역사 왜곡이 부쩍 늘고 있다. 총성없는 외교전이 시작된 것이다. 국익이 달린 현안에 여야가 따로 없이 국론을 한곳에 모으곤 하는 각 나라들이다. 가까운 이웃이 먼데 친척보다 낫다는 말은 언제나 진리가 아니다. 이웃 간 화목이 깨지고 싸움이 격화될수록 이웃사촌이 원수지간이 된다.
20년의 세월이면 양국 간 우호관계도 크게 성숙되었을법도 한데 ‘역사’를 놓고 이웃 나라이면서 골은 깊어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다. 역사상 수많은 민족이 나라를 세웠으나 힘이 없는 국가는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사라져 갔다. 조선 역사 이래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려온 우리민족이다.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대동단결이 요청되는 시기다.
/주필
2012년 08월 23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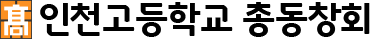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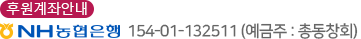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