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화가 김병종(71회) [우리 손주에게]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조선일보(20. 7. 1)
AI 시대라도 생명의 色 잃지 말고 너만의 길을 가렴
[우리 손주에게] 화가 김병종
손주 세대를 위해 인생 선배들이 가슴속에 품었던 말을 꺼냅니다. 화가인 김병종(67) 서울대 명예교수는 세 살배기 쌍둥이 손주들을 위해 직접 글을 써 보냈습니다.

쌍둥이 손자 도겸, 도윤과 함께한 김병종 교수. 그는 손자들에게 "너희의 색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병종 제공
겸아, 윤아. 너희가 처음 만난 세상의 색(色)은 무엇이었니. 신발을 신기면 으레 마스크를 채워줄 줄 알고 기다리는 너희를 보며 세상에 대한 색채의 첫 기억이 혹 하얀색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그 이쁜 얼굴의 반을 하얀색 천으로 가리게 해 짠하고 미안한 마음이란다.
"아버지, 지금 막 쌍둥이 사내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너희 아빠의 전화를 받던 재작년 가을 자정 무렵, 나는 멀리 남쪽의 고택에 머물고 있었다. 달빛이 방안에까지 넘실거려 뒤척이던 참인데 전화를 받고 마당으로 나서니 휘영청 밝은 달이 가득하더구나.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다시 한 세대가 오는 걸까.
처음 너희 아빠를 얻던 날이 생각났다. 그 작고 가벼운 생명체를 담요에 담아 안고 병원 문을 나설 때 햇빛 쏟아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갑자기 두려워지던 기억. 사람들은 축하한다고들 했지만 어찔하던 현기(眩氣)와 함께 알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 죄의식 같은 것이 한꺼번에 엄습했단다. 아마도 정글 같은 세상을 헤쳐가야 할 여린 생명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병종이 그린 '소년상'.
너희가 태어나던 그 새벽에도 할아버지에겐 바람처럼 일어나는 마음의 서성임이 있었다. 그래서 달빛에 의지한 채 신작로라 불리는 옛길을 하염없이 걸었지. 하늘엔 별이 총총한데 가끔 머물러서 보면 '슈욱~' 하면서 멀리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어.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어릴 적 풍경이었지.
그 시절 봄이면 보랏빛 자운영이 끝 간 데없이 펼쳐지고 노란 구름처럼 일어나던 송홧가루 하며, 파란 보리밭 사이로 둥둥 떠가던 오색 상여의 모습 같은 것이 나를 '먼 북소리'처럼 '환쟁이'의 길로 불러내었던 것 같구나. 내가 만난 색은 그렇게 푸르고 붉고 아득한 노란색이었단다.
열다섯 살 무렵 역 앞 '복지다방'이란 곳에서 '혹(惑)'이란 이름으로 '야시쿠레'한 여인 그림의 전시를 열어 집안 어른들로부터 지청구를 듣던 일이며, 새벽녘 찬밥 비벼 먹고 화가가 되겠다고 완행열차 잡아타고 서울로 떠났던 이야기들을 언젠가 너희를 무릎에 앉혀놓고 도란도란 들려주고 싶구나.
그 새벽 산새울음만 들려오는 산길을 홀로 걷는데, 귓가에 "할아버지 그냥 그렇게 쭈욱 가세요"라는 너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문득 '신행태보(信行太步)'라는 말이 생각났다. 하늘을 믿고 그 방향으로 걸어간다.
살아보니 삶은 속도보다 방향인 것 같더구나. 우리는 지금 한 세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명의 최대 스펙트럼의 나날을 살고 있다. 뭔가 어깨를 툭 쳐서 돌아보면 벌써 저만치 과거가 되고 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어느덧 나도 등으로 석양의 빛을 받으며 인생의 산마루를 내려가고 있는데, 때로는 아쉽게 뒤돌아보고 다시 나타난 등성이가 숨가빠오지만 한 세대는 가고 다시 한 세대는 오는 것이니 나는 나의 가던 길을 휘적휘적 가려 한다. 인공지능이니 AI니 수선을 떨지만 생명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영감만큼 가슴 떨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처음 너희가 발걸음을 떼며 내 집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어떤 이의 시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듯한, 어마어마한 존재와 시간의 중량 이 함께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단다.
겸아, 윤아. 내일은 너희가 이 할아버지 집에 오는 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벌써부터 손을 몇 번씩 씻고 샤워도 하며 너희 맞을 준비에 설렌단다. 너희 엄마야 속으로 언짢을지도 모르겠다만, 내일은 기어코 마스크를 벗기고 너희 그 살 냄새 나는 여린 뺨에 내 뺨을 대어 마음껏 비비고 싶구나.
2020.0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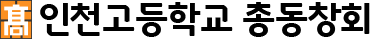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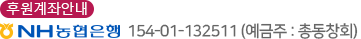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