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글
이 무슨 날벼락인가! 숭례문 화재 사고를 접하고
본문
언제 다시 그의 아리따운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참으로 기가 막히도다. 우리의 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서 외제 명품만 찾고, 외국 나들이를 무슨 자랑거리인 양 으스대던 우리가 아니던가. 이는 외화내빈(外華內貧)과 허장성세(虛張聲勢)가 빚어낸 자업자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 시커먼 잿더미 속에 드러난 그의 처참한 몰골과 앙상한 기둥들. 내 오른 팔이 잘린 것처럼 통곡을 묻는다. 다시 그의 옛모습을 찾는다 할지라도 명품에 덫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그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우리의 죄는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지난날 내가 그를 위하여 작품을 써서 발표하던 때를 생각하니 더더욱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마치 내 사랑하는 이의 뼈가루를 흐르는 강물에 뿌리는 것처럼 허전함 마음 가눌 길 없다. 그래서 전에 발표한 작품을 다시 읽어본다.
남대문은 울고 있다
진 우 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따금 나는 용무가 있어 서울에 들르게 되면 일부러 짬을 내어 남대문을 구경하고 와야만 직성이 풀린다. 마치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형제의 안부를 묻듯이. 어쩌다가 깜박하고 돌아오는 날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듯하고 변을 눈 뒤에 밑을 닦지 않은 것처럼 마음이 영 개운치 않다. 이제는 눈을 감아도 그의 모습이 확연히 떠오를 정도로 나는 남대문에 대해 애착심이 강한 편이다.
남대문의 본래 이름은 숭례문(崇禮門)인데 그 현판의 글씨는 세종의 맏형인 양녕대군이 썼다고 한다. 국보 제1호로 지정된 그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29번지 오거리 중앙에 세워져 있다. 이 태조 7년(1398년)에 완공되었다가 세종 30년(1447년)에 개축하였는데 그 형태가 웅장하고 세부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수법으로 다루어 이조 건축 양식의 정수라고 일컬어진다. 이러고 보면 그의 연륜도 어느덧 6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넘어선 셈이다. 그간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 그 숱한 전란을 겪으면서도 소실은 면했으나 양쪽에 연속되어 있던 성벽은 1908년에 헐렸다고 한다. 그리고 1961년 7월에는 6.25동란 때 일부 파괴된 것을 헐어버리고 전면적인 개축에 착수하여 1963년 5월 10일에 준공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에게는 1971년 4월 12일에 있었던 일은 잊을 수가 없다. 지하철 1호선 개통을 위한 굴착 공사가 시도된 날로서 그에게는 너무나도 뼈 아픈 일이었다. 그것도 그의 석축에서 불과 2.2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기에 더욱 그러했다. 아무리 현대화가 좋다 하더라도 자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것에 화가 치밀었다. 어느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나 그렇게 하기로 한 정책 입안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낯짝에 침이라도 뱉어 주고 싶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느꼈던 울분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는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다. 그 후 만 3년 4개월이 걸린 공사 끝에 1974년 8월 15일에 개통식을 가졌다. 하지만 그 개통식은 화려하게 거행되지 못했다. 까닭인즉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문세광의 총탄에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서거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는 오히려 속으로 웃었다. 만일 그 개통식이 떠들썩하게 치러졌다면 그에게는 고통의 무게가 더 가중되었을지도 모를 것이기에.
이러매 나는 그를 대할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을 가눌 길 없다. 마치 그가 나더러 자신을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의 주변엔 오가는 수많은 차량들로 혼잡스럽다. 마치 그의 숨통을 죄려는 듯 위협하며 달려들다가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차량들. 하여 그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게다가 어디를 둘러보아도 시선이 막혀 갑갑하기만 하다. 대한화재, 흥국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대경빌딩, 중앙일보, 기업은행, 단암빌딩, 상공회의소 등등의 건물이 위압적인 자세로 내려다보며 서 있기 때문이다. 이러매 한 점의 빛도 새어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감금된 듯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이젠 종이 호랑이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국보 제1호라는 찬사 따위는 과감히 내던져 버리고 싶다. 차라리 숨 한번 제대로 쉬며 새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다는 욕구만이 갈수록 솟구쳐 오른다.
이렇듯 그는 숱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흐느끼다 못해 울부짖고 있다. 사람들의 다정한 관심이 닿지 않은 지도 꽤 오래되었다. 예전 홍예문을 통해 인마(人馬)의 통행이 자유롭던 그때가 사뭇 그립기만 하다. 저마다 사는 모습이 각양각색이어도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아기자기한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지 않은가.
그러나 이제는 그런 낙조차 누릴 수가 없다. 마치 황량한 들판에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뒷방차지나 하게 된 처량한 신세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이러매 가슴속에 겹겹이 쌓이는 분노에 성난 사자처럼 사방팔방으로 내닫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처지이고 보니 더욱 화가 치밀고 서럽기만 하다. 언제까지 마를 길 없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가야만 하는가. 끊임없이 질주하는 차량의 소음과 먼지에 숨이 막힐 것 같다. 특히 전동차가 오갈 때마다 전해져 오는 진동은 더욱 그렇다. 때로는 밤 깊어 사위가 적막해지면 뼛속깊이 스미는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밤을 하얗게 밝히기도 한다.
오늘도 그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대화라는 물결에 무참하게 희생양이 된 그. 눈에는 서러움과 원망의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먼 하늘을 쳐다본다. 그의 온몸이 늘 쑤시고 아파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일처럼 알아주는 이가 없다. 어디에다 하소연할 길 없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서만 애태우는 그.
나는 그에게서 발길을 돌릴 때마다 걸음이 차마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마치 오래도록 못 볼 어린 자식을 남에게 맡기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나는 어버이처럼, 아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든 부모를 자주 돌보지 못하는 자식처럼. 왜냐하면 단 하루라도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입김이 그리워 못 견뎌 하는 그가 나더러 혼자 내버려두고 가지 말라며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때문이다.
(2003년,자유문학)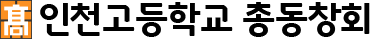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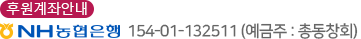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
윤인문(74회)님의 댓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국상(國喪)에 준하는 국가적 추모 행사로 치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네요. 전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재 방제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