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글
용대의 바지랑대
본문
 외포리 앞바다에는 새우젓배가 떠 있고 진강산은 뭉게구름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식솔의 무게만큼 빨랫줄의 무명옷감들이 수차골 냇가에서 어머니에게 방망이로 무진장 얻어맞고 바짝 비틀림을 당한 후 햇볕에 일광욕을 즐기고 있네요. 동생의 구멍 난 하얀 통 팬티는 수줍어하고 학교 가실 때만 입으시던 아버지의 흰 와이셔츠가 오늘따라 하늘의 파란 물을 들이고 있어요. 누구의 속 고쟁인지 몰라도 바람에 나부낍니다. 축 늘어진 빨랫줄을 바지랑대가 비스듬히 받혀주고 있군요. 때 이른 고추잠자리가 저공비행을 하다 두 개로 갈라진 바지랑대의 귀에 사뿐히 내려앉네요. 모자이크 눈을 연신 굴리며 꽁지는 하늘을 향하고.. 허구 헌 날 허리가 휘도록 뙤약볕에서 맡은 바 수임을 다하던 바지랑대도 이제 늙어 뼈만 앙상하게 남고 피부는 새까맣습니다. 가끔 돼지가 우리를 벗어날 때 급한 김에 몽둥이로 변신하여 동원되더니만 어느새 정년퇴임을 맞습니다. 쓸쓸한 퇴장이지요. 용대는 이때를 기다려 이제부터 긴요하게 바지랑대를 쓰렵니다. 어쩌면 용대보다 나이를 더 먹었을 수도 있는 바지랑대를 굴뚝 뒤에서 가져 나와 개나리줄기를 꺾어 둥그렇게 모양새를 만든 다음 새끼줄로 동여맵니다. 그리고 보아 두었던 보꾹에 쳐진 거미줄을 돌돌 말아 잠자리채를 만듭니다. 아랫집 인상네 것도 감고 뚜껑네 것도.. 이웃집 시갑이네 처마에 쳐진 거미줄을 감으려면 유난히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할 것을 가져간다고 시비를 건 것이지요. “야! 이놈아, 거미잔등에 네 이름이라도 새겨 놓았니?” “우리 집에 쳤잖아?” “너 자꾸 그러면 우유 찐 거랑 건빵 안준다?” 밤이면 앞마당에 펼친 밀거적에 놀러와 쌍바위골의 비명소리를 자주 내 핀잔을 듣고 그래도 숨죽여 가죽피리를 잘 불던 동생보다 한살아래 애입니다. 먹성 좋던 녀석이 그걸 잘 얻어먹던 터라 잔뜩 인상만 쓰고 결국 허락하고야 맙니다. 하긴 왕거미에게는 늘 송구하고 미안하지요. 아픈 배를 움켜잡고 밤낮으로 일해 짠 거미줄을 단번에 훔치니 왕거미의 기분을 십분 이해할만합니다. 아침이슬을 맞으면 영롱하게 빛나던 방사형의 거미줄을 번번이 잃고 마니까요. 바지랑대는 신이 난 용대의 손에 들려 전사의 창이 되어 매미가 울어대는 죽순나무로 달려갑니다. “매암매암 맴맴 맴” 더위를 식히듯 잘도 웁니다. 용대가 아마존의 전사처럼 웃통 벗고 달려오는 것을 알아챈 매미가 울다가 “찍!” 용대의 얼굴에 오줌을 싸고 황급히 날아갑니다. “어라! 저놈 봐라.” “쓰르 쓰르” 쓰르라미도 덩달아 울음을 멈춥니다. 죽순나무를 가만히 살피니 울다 지친 매미 한 마리가 보이네요. 두툼하게 거미줄이 감긴 바지랑대를 가만히 덮어씌우니 화들짝 놀란 매미가 날다 걸려듭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바지랑대군요. 용대는 여름을 하나 둘 잡아 봅니다. 버둥거리던 매미도 인정을 하고 얌전해지네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초가지붕의 둥근 박이 엉덩이를 들썩이다 환하게 미소 짓네요. 텃밭 옥수수도 수염을 태우다 누런 이를 들어 내 키들거립니다. 뒤뜰 오이 밭에 오이가 늙어 노각이 되어 천덕꾸러기가 되네요. 하긴 일찍 발각 되었으면 동생과 가위바위보의 희생양이 되겠지요. 가물어 오이의 밑 둥이 너무 써 똑 같이 자르면 안돼요. 불문율이죠. 동생도 바지랑대를 가지고 장독대에 앉은 잠자리를 잡으려다 놓치고는 분풀이로 간장독에 둥둥 뜬 메주를 바지랑대 끝으로 찌릅니다. 그러면 숯과 빨간 고추랑 잘 놀던 메주가 갈색의 간장 아래로 머리를 쳐 박습니다. 숨이 가빠 머리를 내밀면 짓궂게 또 찌르고.. 더욱 심심해지면 바지랑대를 든 동생과 용대는 장독대에서 칼싸움을 벌입니다. 용대의 칼은 지게작대기입니다. 둘은 김유신 장군도 되고 강감찬 장군도 됩니다. 시공을 마구 넘나듭니다. 검증되지 않은 검법으로 이리저리 휘둘러 댑니다. 그러다 오래되어 삭은 바지랑대는 젊고 싱싱한 지게작대기에게 맞아 두 동강이 나며 장렬히 최후를 맞습니다. 마지막 흔적이라도 남기려는 듯 부러진 바지랑대가 튕겨나가 조그만 빈항아리를 때려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합니다. “에고! 이거 정말 큰일 났군요.” 어머니가 이 일을 아시면 혼쭐이 납니다. 동생과 용대는 겁에 질려 어머니 몰래 완전범죄를 꾀합니다. 깨어진 항아리를 조심조심 거두어 덤불 속에 감춥니다. 그러자 바지랑대는 이마에 얼기설기 거미줄을 남긴 채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숨 가쁘게 한평생을 살아온 바지랑대는 아궁이에서 제 몸을 불살라 따스함을 주고 봉사를 하다 재를 남겨 사라집니다. 굴뚝에서는 저녁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어머니가 걸은 놓으신 알뜰살뜰한 무쇠밥솥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삶의 무게를 지탱하던 바지랑대가 그립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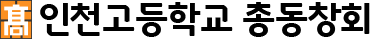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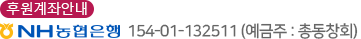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