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글
주중 낚시
본문
주중 낚시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다니던 낚시터를 주중에 와서 대를 펴고 앉아 있어보니 결코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은퇴 후에는 여유를 가지고 평소에 즐기는 낚시나 다녔으면 하는 것이 그동안의 꿈이었는데 아직 한참은 더 일할 나이에 퇴직하고 나서 손을 댄 일이 여의치 않아 잠시 일손을 놓고 있다가 답답한 마음에 모처럼 주중에 낚시를 나왔지만 자리를 잡고 앉았어도 어색하기만 할 뿐 도대체 흥이 나지 않는다. 출발 전 집사람에게 같이 바람도 쐬고 언니도 만날 겸 동행하자 했더니 혼자나 다녀오되 일없이 평일에 놀러 다닌다고 소문 낼일 있냐며 낚시터 근처의 양계장에는 아예 들르지도 말라는 집사람의 다짐도 무척이나 마음에 걸린다.
만평 정도 크기의 바른골 낚시터는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신리천 상류의 유료터로 제철에는 오륙십 석 정도의 모든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붐비기도 하며 보통 주말에도 언제나 수십 명의 조사들이 찾는 곳인데 그날은 일기가 나쁘지가 않았는데도 주중이라 그런지 앉아있는 손님은 여기 저기 모두 합해서 열 명이 안 돼 보였다.
낚시터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는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큰 동서가 장인어른과 함께 시작한 양계장이 있었기 때문에 유료터로 관리되기 한참 전부터 양계장 집 낚시꾼사위인 나는 틈틈이 바른골 저수지를 찾아 낚시를 즐기곤 했다.
신혼 초 어느 봄날 지금은 바른골의 명당자리가 된 상류 산자락의 한 자리에 앉아 오전 내내 지렁이 미끼에 계속 찌를 건드리는 입질과 씨름하던 나는 몇 마리의 미꾸라지만 낚아내다가 그 입질의 정체가 가재라는 걸 확인하고는 대를 걷은 적이 있었다.
또 어느 한 겨울에는 한번 얼음 낚시하러 갔더니 동내 청년들이 낚시를 금지한다고 하다가도 바로 아래동내 양계장 집의 사위라고 했더니 낚시를 허락해서 낚시를 시작하자마자 얼음구멍에서 여덟 치 급 붕어를 낚아내자 ‘야.
이런 겨울에도 이렇게 큰 붕어가 나오네.’ 하며 그 청년들이 신기해할 정도로 바른골은 아주 때 묻지 않았던 산골 저수지였는데 한참 뒤 유료터로 바뀐 후에는 몇 번이나 관리인이 바뀌었다고 했다.
직장관계로 오랫동안을 지방에 있다가 수원으로 이사 온 후 다시 찾기 시작한 낚시터가 바로 바른골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유료터 이외에는 적당히 다닐 곳을 찾기도 어려운데다가 집에서 멀지도 않고 동서식구도 바로 근처에 있으며 낚시터 풍광도 그런대로 수준급이고 유료터 관리상태도 좋아 가끔은 떼 붕어의 손맛도 볼 수 있어 아예 단골 낚시터로 정하고는 자주 바른골 낚시터를 찾게 되었다. 낚인 붕어를 돌아갈 때 양계장에 들러 가져다주면 양계장의 일꾼들이 매우 좋아해서 동서부부도 반가워하곤 했다.
그러다가 퇴직 후에도 가끔은 바른골을 찾았는데 주중에는 처음으로 낚시터를 찾아와 본 것이다.
낚시터에 도착해보니 건너편 산 밑의 연결 좌대에 세 명이 드문드문 앉아있는데 그곳은 이 유료터의 최고 명당으로 주말에는 십여 명이 늘 앉는 곳이다. 처음 낚시터에 도착해서는 그쪽에 가서 자리 잡을까 하다가 입구에서 가까운 관리사무실 앞쪽에 자리를 잡고 대를 폈다.
부근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서너 자리 옆 오른쪽으로 사십대의 조사가 혼자 낚시하고 있었는데 살림망도 담그고 있어 내 앉은 곳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자리를 정했다.
고기를 풀어놓는 유료터는 자리보다는 고기들이 모여들게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익히 알고 있는데다가 그 자리는 건너편의 명당자리만은 못해도 그런대로 바른골에서는 알아주는 붕어자리인데다가 남들과 동떨어진 자리보다는 근처에 다른 이웃조사가 있는 편이 더 덜 적적하리라 해서 일부러 그 자리를 정했다.
대를 두 대 편 후 밑밥으로 헛챔질을 각 대마다 십여 회 정도 한 다음에 자리를 고쳐 앉아 물 위 가까이 세워진 두 찌를 응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낚시에 접어들었다.
원래 붕어낚시의 경우 길이가 다른 두세 대 정도의 대를 펴 놓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몇 해 전부터인가 유료터에서는 같은 길이의 대를 사용해서 뚜 찌 간의 간격을 되도록 가깝게 해서 낚시하는 것이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았는데 나도 얼마 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낚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방법이야말로 한번 붕어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유료터의 낚시 요령임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이삼 분 내지 오 분 간격으로 입질이 없어도 새로 떡밥을 갈아주며 첫 입질을 기다린다. 이제부터는 차분히 앉아 기분도 가다듬어 불편했던 마음도 모두 털어버리려고 오직 찌만 응시하며 혼자만의 시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바람도 적당히 불고 수위도 좋은 상태여서 그런대로 재미 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런데 자리를 펴고 얼마 후부터 옆에 앉은 친구가 자꾸 신경이 쓰이게 한다.
언제부터인가 핸드폰으로 통화중인데 두세 자리 건너서 들려오는 그 통화내용이 자꾸 귀에 거슬린다.
들렸다 말았다 하는 목소리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내 귀를 기울이게 한다.
“............뭐라구? 아직? 응, 응....... 뭐 아직 라인에 걸리지도 않았다구? 그래. 응.........
잠깐만 기다려...........그래 그래서?
여 봐. 박 과장, 아침까지만 해도 어제 현장에 다녀와서 본 걸로는 금주 내 입고에 차질 없을 거라고 했잖아. 응, 응........ 응?
박 과장, 조금 전 다시 확인해보니 그런 거라구? 야 이 친구야 내가 그래 뭐라 하더나. 거긴 말로만 듣지 말고 늘 잘 살펴야 한다고 늘 그러던 곳 아니야.
그래서....... 응 ........ 응 ..........
그 쪽 최 부장이 장난치는 거 같단 말이지........ 응 .........응..........”
통화내용으로 짐작해보니 그 조사의 회사에 무슨 일이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다.
나도 이 쯤 되니 그 친구의 통화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게 된다. 입질 없는 찌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친구의 통화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참이나 박 과장이라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조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
“야, 박 과장,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박 과장, 이 바닥에서 밥을 일이 년 먹었나, 박 과장 당신 말이야 하청업체 관리 고작 그 정도밖에 못하겠나. 어떡할래. 방법이 잘 없을 것 같다구? 갈수록 태산이구먼. 당신말이야 지난 번 윤 차장 꼴 나고 싶나. 그런데....... 뭐, 뭐라고? 그래서......... 응.........응........잠깐만........ 그래.......”
가만히 듣고 보니 회사의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인 모양이다. 그런데 그 친구의 전화로 야단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 조사는 전화를 받는 중에 가끔 핸드폰을 내려놓고 대를 당겨 미끼를 갈아 끼워가며 통화를 계속하는데 통화하는 상대는 이 친구가 낚시터에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눈치 같았다.
이제 내 관심은 통화내용보다도 전화로 한참 박살나게 혼나고 있는 그 박 과장이란 친구가 사장인지 아니면 상사인지 아직까지 헷갈리는 옆자리의 조사가 과연 어디서 무얼 하며 전화하는지 알고 있을까 하는 거였다.
내가 두 대의 미끼를 서너 번 갈아줄 동안에도 통화는 계속됐다. 그러니 이삼십 분은 족히 지난 것 같은데 옆의 조사는 계속 박 과장을 전화로 혼내고 있었다.
나의 경우라면 옆의 조사처럼 대낮 근무시간에 낚시터에 앉아 회사 일을 핸드폰으로 챙길만한 배포도 없었음은 물론이거니와 회사 일이 통화내용 정도면 벌써 대를 걷고 회사로 갈 것 같은데 그 작자는 낚시를 계속하면서 부하직원인 박 과장을 몰아세운다.
예전 내가 과장시절 옆 부서의 김 부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김 부장이야말로 회사에서 지독하다고 소문난 사람으로 누구도 그에게 야단맞을 경우는 꼭 고양이 앞의 쥐 신세였다. 그래도 그건 사무실에서의 경우지 김 부장은 밖에 나가 호박씨 까며 부하들을 혼쭐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작자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근처에 다른 꾼이 낚시하고 있다는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 정도 목소리면 주위의 다른 조사에게는 무척 실례를 범하는 거다.
이제 나도 속으로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이 친구, 여기 낚시터를 자기 사무실로 아나. 뭐 이런 작자가 다 있어.........)
물론 입질도 없는데 그 친구의 목소리에 붕어들도 다 주눅이 든 거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그 친구의 전화는 그칠 줄을 모른다.
통화는 계속된다. 무척이나 짜증나는 긴 통화다.
그러던 중 첫 입질이다.
오른쪽 찌톱이 깜박이기 시작한다.
내 오른 손은 벌써 오른쪽 대에 올려놓고 챔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찌 오르기만 기다리는데 갑자가 찌가 물속으로 잠긴다. 붕어 입질과는 다른 입질이다.
“뭐야. 잉어야?”
나는 대를 당겨 채면서 순간 바른골의 그 우악스런 잉어들을 머리에 떠 올렸다.
수년 전 바른골을 관리하던 어느 목사님이 방류했다는 두자 넘는 수십 마리의 잉어들은 바른골을 찾는 붕어꾼의 낚싯대를 수없이 망가뜨렸다.
나도 두어 번 그 잉어의 입질을 받아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채비가 끊기는 반갑지 않은 경험이 있어 긴장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괴물 잉어의 입질이었다. 당긴 2.9호대에 묵직한 촉감을 느껴 대를 세워 올리려는 순간 무지무지하게 당기는 힘이 장난이 아니다.
나는 낚싯대를 일부러 놓아버렸다. 좌대아래 물로 떨어진 낚싯대는 물위에 잠시 머뭇하더니 금방 저수지 안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한다.
“야! 내 낚싯대! 내 낚싯대! 잉어다!....... 잉어야....... 잉어가 낚싯대 끌고 간다.”
나는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며 일어섰다. 멀리 건너편 좌대의 조사도 두엇이 일어나 이쪽을 주시한다,
이미 곁눈질로 옆의 그 조사가 갑자기 당황해하면서 핸드폰을 덮어 끊는 것을 확인하고서 나는 붕어 올릴 때보다 더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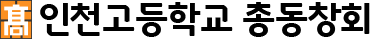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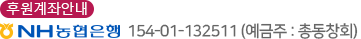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
李桓成님의 댓글
입질의 정체가 가재라는 걸 확인하고는 대를 걷은...
가재는 왜 기피하나요
바다가재는 高價인데...
劉載峻님의 댓글
반갑습니다 이곳 미국은 4.29.2011 오후 12시11분 낮 정오를 막 넘긴 시간에 잠시 읽었습니다 평일 낚시, 골프, 사업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물 ? 이죠 선배님 경우 예외가 되지만 말입니다 낚시, 골프 공히 time consumming 즉 상당 시간이 소요 되는 여가이어 옆 자리 조사 같은 경우 아예 낚시터에 오질 않았어야 하죠
박홍규님의 댓글
낚시는 그야말로 어지러운 속세를 벗어나 세월을 낚는 것인데...핸펀 덮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