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글
장지포 이야기
본문
장지포 이야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해방둥이인 사촌형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1961년도, 그러니까 사촌형님이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해 여름 어느 한밤중에 살무니의 장정들이 장지포에서 가래질 소동을 벌이게 된 사연은 이렇다.
가래질이라 하면 고향 강화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의 고기잡이방법으로 한 여름 오후쯤 많은 남정네들이 가래라고 하는 일종의 통발을 하나씩 가지고 방죽에 모여 고기를 잡는 일종의 천렵이다. 바쁜 농사일이 주춤해지는 두벌 논매기 끝자락부터 시작되어 늦여름에 그 절정을 이루는데 그럴 때는 한꺼번에 수백 명의 사내들이 장지포 방죽에 모여 시끌벅적거리기까지 했다.
그해에는 초여름에 한두 번 소규모로 가래질이 시작은 됐으나 날이 계속 가물어 논물이 말라 밤낮없이 두레나 무자귀로 방죽가의 논에 방죽 물을 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방죽에서 가래질을 해대면 흐랑물에 방죽바닥의 염분이 솟아 그 물에 모가 탄다고 건평리 마을 사람들이 다른 동내사람들의 가래질을 막았다.
바닷가가 가까운 건평리 마을사람들은 바다생선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방죽의 민물고기에는 큰 흥미가 없어 거의 가래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동내 사람들처럼 가래질 못하게 된 것을 크게 아쉬워하지 않았다.
해마다 여름마다 가래질로 적어도 손바닥보다 더 굵은 붕어, 잉어, 메기, 가물치, 모치, 빠가사리........등을 신나게 잡아낼 뿐 아니라 그걸로 만드는 민물조림도 집집마다 한여름동안 모처럼 맛보는 별미의 맛인데........
가물어 줄어든 방죽 여기저기에 몰려있을 고기떼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좀이 쑤셔도 가래질꾼들은 그저 어서 비만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이럴 때는 낚시질도 눈치가 보이는 법인데 가래를 들고 방죽에 들어선다면 십중팔구는 가래로 몇 번 바닥을 찍기도 전에 육두문자의 욕설이 시끄러울 것이요 건평리 사람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한다 해도 역성들어 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니 동내마다 가래질을 하고픈 사내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했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살무니 동내에서 한 어른이 바람을 잡았다.
오늘 인산리 다랑말에서 방죽으로 가래질을 간다더라. 물론 건평 사람들 몰래 한 밤중에 다녀온다는데 우리 살무니에서도 오늘밤 가래질가자. 저녁 먹고 갈 사람은 준비해서 명구네 집 앞으로 모이자........ 인산리에서 오늘밤 그렇게 하고나면 내일부터는 건평에서 아예 밤마다 방죽에서 망을 볼 거 아니냐. 오늘 밤 한 번밖에는 없는 기회다. 건평 사람들은 겨울이면 살무니 진강산의 남의 동내에 와서 낭구만 잘도 해가면서 가래질은 못하게 하는데 정말 경우 없는 동내 인심이다 안 그러냐 해가면서 말이다.
좀 켕기기는 하지만 제법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던 모양이다. 그날 저녁 한둘씩 명구네 집 앞에 가래와 망태를 챙겨 모인 동내 장정들은 마흔 명 정도였는데 살무니에서 한 철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가래질 갈 때에의 육십 명 정도를 비교해 봐도 상당히 많은 사내들이 모인 것이다. 그날 한 낮에 바람을 잡은 어른은 형님의 친구인 충구의 아버지 되는 어른인데 충구네 아버지보다 더 연장자인 어른도 두어 명 함께 했고 막내들인 사촌형님 또래도 서너 명 모였으니 그날 밤 도둑 가래질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출발 전에 미리 작전을 세웠는데 원래는 동내사람들이 늘 옷 벗는 곳에서 가까운 도깨비 방죽에서 가래질을 시작해서 수문통까지 간 후 다시 돌아 나오며 가래질을 계속해서 도깨비방죽에서 가래질을 마치지만 오늘저녁 옷 벗는 장소는 그대로하고 한참 더 내려가서 배나드리 아래의 수문통근처에서 가래질을 시작해서 도깨비방죽 쪽으로 올라오는 식으로 하기로 했다. 어둡기도 하지만 켕기는 점도 있으니 그렇게 조정한 것이다.
살무니의 일행은 날이 어두워져서 출발했다.
용냇길을 따라 내려가 흥천을 가로지르는 신작로를 건넌 후로는 이미 캄캄해져 이 도둑 가래질꾼 행렬은 보무도 당당히 시시덕거리며 내 뚝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개울 길은 한참동안 인가도 없는 들판으로 이어져서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참 뒤 방죽 가까이의 용내를 가로지른 독점집 아래의 큰 길을 건너서부터는 모두 입을 다물고 되도록 조심조심 개울 옆 뚝 길을 따라 옷 벗는 장소까지 소리 죽여 걸었다.
옷을 벗어 놓고 가래와 망태를 고쳐 맨 일행은 어둠이 깔린 논 뚝 길로 해서 한 줄로 조심조심 제법 내려가서 배나드리 아래쪽의 방죽으로 숨죽여가며 물속으로 한 명씩 들어갔다. 그곳은 장지포 방죽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가래질 때 물이 많으면 가슴까지 차오르는 경우도 있으나 그날은 그곳도 물이 사타구니 정도에 가까스로 차올라 올 정도로 물이 줄어 있었다. 앞선 한사람 씩 신경을 써가며 가래로 방죽 바닥을 조용히 찍어나가기 시작했지만 곧 인기척과 가래 찍는 소리에 놀란 고기들의 튀거나 도망치는 기척이 여기 저기 들리기 시작하니 곧 모두는 고기들에게 신경이 쏠리면서 가래질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가래 안에 고기가 들면 고기가 놀라 튀다가 가랫살에 부딪치는 소리와 감각으로 고기든 것을 확인하고는 손을 가래 안에 넣어 갇힌 고기를 움켜내기만 하면 되니 어두운 밤이라고 해서 가래질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곧 어른 하나가 “잡았다. 붕어다.”하니 모두의 귀가 그쪽으로 집중한다.
“커요?”
“그저 그래. 손바닥 보다 조금 더 커.”
“나도 하나 잡았다. 메기다. 메기.”
이제 모두의 본격적인 가래질이 시작됐다. 여기저기서 가래 안에 손을 넣고 고기를 잡기 시작한다.
그런데 호사다마라........
밤늦게 무자귀로 논에 물을 퍼 올리던 동내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거기 뭐 하는 거요. 가래질하는 거요. 가래질하면 안 됩니다. 나가쇼 얼른.”
하는 소리가 들려 일행은 순간 긴장했으나 그 남자의 소리는 이쪽의 기세에 눌린 듯 약간은 기가 죽어 들어가는 목소리였고 어디서 일행 중에
“괜찮아. 그냥 해라. 한사람인데.”
하고 호기를 부리자 일행은 조금은 켕겼지만 이미 고기 쫓는데 정신이 팔려 그냥 무시하고 가래질을 계속해나갔다.
사촌형님도 첫 마수로 한자 정도 크기의 잉어 한 마리를 건져내서 망태에 넣고 나서였다.
“누구야. 한밤중에 가래질하는 놈들.”
“이놈들아, 이 도둑 같은 놈들아.”
“잡아라. 이 나쁜 놈 들.”
갑자기 동내 쪽에서 고함소리가 들려오며 여러 사람들이 방죽가로 달려오는 기척이 들리자 일행은 깜짝 놀랐다. 아까 그 물 푸던 친구가 동내에 가서 마을 사내들과 함께 몰려온 모양이었다. 가래질하던 일행은 그만 혼비백산하여 어른이고 젊은이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얼른 가래를 들고 동내 반대편의 뚝 길로 올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촌형님도 다른 어른들을 쫓아 방죽 논길로 올라서는 그냥 논 속의 다 자란 모를 헤쳐서 내달리기 시작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서 잡힐까봐 겁에 잔뜩 질려 죽을힘을 다했다한다.
무턱대고 옷 벗는 쪽을 향해 달리는데 숨이 차도록 헐떡거리며 넘어지고 정신없이 달려서 오니 몇은 이미 옷을 움켜잡고 달려가는데
“걱정 마. 여기까진 안 온다. 천천히. 천천히. 숨 좀 돌려.........”
군대 다녀온 한 장정이 소리치니 그제야 일행은 주춤하며 옷 벗는 자리에 모여 숨을 몰아쉬며 조금은 진정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아직 악을 쓰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지만 기를 쓰고 방죽을 건너오지는 않는 것이 분명했다.
이쪽까지 건너오려면 발목까지 뻘에 빠지고 정강이 위로 물이 차는 방죽을 건너거나 아니면 배나들이의 줄로 당겨 건너는 거룻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데 둘 다 만만한 일도 아니고 그리한다 해도 이쪽까지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말이다.
대충 옷을 입거나 챙긴 일행은 터덜터덜 걸어서 살무니 근처의 개울가지 와서야 그곳 개울에 흐르는 물에 대충 씻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는데 살무니 아래의 개울은 이미 물이 말랐기 때문이었다.
씻으면서 살피니 일행 중 서너 마리까지 잡은 사람도 있으나 아직 절반은 개시도 못하고 쫓겨난 꼴이었다.
그렇게 그날의 야밤 가래질은 끝을 맺었다고 한다.
그 뒤 몇 해 후 가래질은 초코 그물의 극성과 농약 풀어 고기 잡는 고약한 방법이 판치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여 자취를 감추었는데 지금도 나이든 어른들 사이에선 그 옛날 가래질의 추억이 화재에 오르곤 한다.
참 그리고 그날 밤 인산리에서도 십여 명 정도가 그 도둑 가래질에 동참했는데 같은 시간에 자기 동내 쪽으로 줄행랑을 쳤다고 형님은 전한다.
덧 글
장지포 뚝은 1666년 현종6년 때 강화유수 서필원(徐必遠)이 내가면의 외포리에서 건평리 사이까지 갯벌을 막은 제방으로 배가 드나들던 장지포포구와 일대의 갯벌이 논과 수로로 바뀌어 생겨난 장지평야를 지켜온 350년 정도의 연륜을 가진 고향의 아주 오래된 뚝 이다. (江華史에서)
그런데 바다를 막은 지 거의 삼백 년이 지나가지만 원래 갯골이었던 방죽의 소금기가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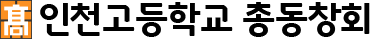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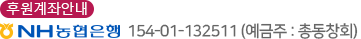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
윤용혁님의 댓글
아련한 추억을 이리도 대하소설처럼 멋지게 풀어주신 효철형님의 필력에 감탄합니다.형님을 통해 가래하는 동네분들을 따라 나섰던 기억이 새롭습니다.아무튼 갈 때마다 캥기는 그 무엇이..형님뻘인 충구의 어른은 옛 관동군 출신으로 술도 잘 드시고..가래질이 사라진 것이 아쉽군요.장지포의 추억 가슴으로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