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글
뜰 안/트럼펫 섬집아기
본문
 사철나무에 포르르 참새가 날아든다. 언제나 초록을 선사하는 이 나무의 주인은 애매모호하다. 옆집이랑 경계의 표시로 심어졌는지 돌담장에 걸터앉고는 흰 눈을 솜이불삼아 참새들을 부른다. 참새의 날개 짓에 퍼덕 눈뭉치가 땅에 나뒹군다. 양지바른 뜰 안은 용대의 놀이터이다. 옷 벗은 고염나무가 까만 고염 몇 알을 달고 닭장을 주시한다. 여름 내내 주렁주렁 달렸던 닭장 위 수세미가 말라 비틀어져 몸을 배배 꼬고 있다. 늦가을 무렵 어머니가 수세미의 밑줄기를 잘라 됫병에 그 수액을 받아 얼굴에 바르시던 그 수세미 줄기가 담쟁이 넝쿨처럼 드리워져 있고... 잘생긴 옆집 수탉과 바람난 암탉은 닭장을 빠져나와 용대의 눈치를 보며 담장을 넘어가려한다. 돌담에는 수수깡들이 거드름을 피며 기대어 서있다. 활 만들기에 열중인 용대는 암탉의 월담도 모르고 개나리 줄기를 휘어 검정고무줄을 감아 시위에 탄력을 주느라 정신이 없다. 드디어 완성이다. 화살은 담장에 기댄 수수깡의 곧은 맨 윗부분을 잘라 그 끝에 작은 못을 박아 무게중심을 앞에 두고 하늘을 향해 연신 쏘아댄다. 사라졌다 다시 돌아오는 화살들... “꼬꼬댁 꼬꼬!” “앗! 이놈이 또...” 바람난 암탉이 옆집에 가 알을 낳았다. 너무나 속상하다. 닭장 안에 알을 잘 낳으라고 대나무로 만든 큰 바구니에 볏짚까지 잘 깔아 놓았건만... 옆집의 사나운 동네누이와 이문제로 승강이를 벌인 적이 한두 번 아니다. 옆집 수탉이랑 바람난 것도 속상한데 알까지... 그리고 그 알을 회수하려면 번번이 똥독할머니라는 별명의 옆집 누이랑 싸워야하니 용대의 부아가 들끓는다. “너 이놈 잡히기만 해라.” 그러나 젊은 암탉이 용대의 손에 쉽게 잡힐 리가 만무하다. 약은 빠짝 오르고... 돌담을 넘어온 암탉을 겨냥해 수수깡화살을 힘껏 당긴다. 그러나 화살은 빗나가 장독하나를 때린다. “땡!” 영문도 모르고 화살을 맞은 장독은 물끄러미 쳐다본다. 다행히 멀쩡하다. 초가지붕에 주렁주렁 달린 고드름의 손 아귀힘이 다해 위태롭다. 아니나 다를까 ‘딱!’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두 동강이가 난다. 노래에는 수정고드름이라 하지만 누런 이빨을 하고 달려있는 것도 있다. 가을에 둥근 박이 허여멀건 엉덩이를 까고 일을 벌이거나 굼벵이가 실례를 해 그렇다고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른들이 그 고드름을 먹으면 몸에 이 생긴다고 극구 말리나 보다. 마당에 나가보니 암탉이 옆집 수탉과 어울려 놀고 있다. 부리를 저어 모래도 입안에 넣고... 용대는 아직 분이 안 풀려 도망치는 암탉을 쫓아가니 수탉이 눈알을 부라리며 덤벼든다. 갑작스러운 수탉의 용맹스러운 공격에 놀라 용대는 잠시 멈칫한다. 마당은 뜰 안에 비해 험한 곳이다. 구슬치기와 딱지치기를 하다 동네 형들에게 많이 잃은 곳이고... 친구들과 자치기를 하다 눈을 다칠 번한 곳이기도 하다. 마당의 커다란 죽순나무가 떨어뜨린 죽순열매를 주워 뜰 안으로 다시 향한다. “마당은 싫어.. 바람이 세게 불어 춥기도 하고...” 용대는 혼자 중얼거린다. 하지만 수탉의 공격에 공포감을 느낀 것이 사나이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어 마당이 싫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앙증맞게 벌어진 죽순나무 마른 열매를 이용해 동물들의 모양도 만들며 혼자 즐거워한다. 용대는 언제부터인가 뜰 안이 어머니의 따스한 품안이라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오후가 되어 심심하면 수챗물이 내려가다 얼은 아주 조그만 빙판에서 썰매를 탄다. 말이 썰매를 타는 것이지 그냥 서 있는 것이다. 워낙 좁고 형편없이 두드러진 빙판이라... 그도 그럴 것이 아침마다 부은 설거지물과 세숫물이 좁은 담장의 하수구멍을 미쳐 빠져 나가지 못해 꽁꽁 얼은 것이 오죽하겠는가? 그래도 그곳에서 겨울방학공책에서나 겨우 본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을 지치는 상상의 날개를 펼쳐본다. 또 눈이 많이 내리면 사철나무에 놀러오는 참새들을 맷방석의 덧으로 유인해 잡을 궁리를 한다. 못자리 꼬챙이를 곧추 세우고 광에서 누런 볍씨를 가져다가... 용대는 잠시 눈을 든다. 뜰 안에서도 보이는 것이 있다. 저 새녘에 흰 눈을 뒤집어쓰고 키들거리는 진강산과 외포리바다에 똑딱 배 지나감도... 그 소리 “똑딱 똑딱” 아니 “통통” 거리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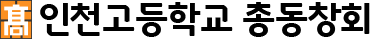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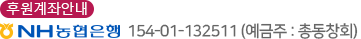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