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글
용대의 가을이야기
본문
 “어이 일어나라! 우리 애들은 왜 이리 잠이 많은지.. ” 어머니의 성화시다. 벽에 걸린 괘종시계를 보니 새벽 다섯 시 오 분 전이다. 아니 곤한 잠을 깨 놓으시고 “어머이! 졸려 죽겠네.” “어서 일어나라니까?” 오늘 우리 집의 새 논과 백수논의 볏단을 일꾼들이 집으로 들이는 날이다. 일요일이 노는 날이 아니라 우리 집은 만날 일하는 날이다. 아버지께서 학교에 나가시기 때문에 모든 집안의 일은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일요일을 택해 응당 하는 것이다. “어이 남영네 아버지와 오촌 아저씨 그리고 운광네 아버지도 진지 잡수시게 오시라 해라.” 아버지의 명령이시다. 시월의 아침공기는 제법 쌀쌀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동생과 같이 태용네 앞마당을 지나 개울을 따라 남영네 집 대문 앞에 다다른다. 외양간의 황소가 숨 가쁘게 달려온 어린 아이의 느닷없는 방문에 귀찮은 듯 머리를 휘저어 워낭소리를 내다 하얀 콧김을 뿜어댄다. “아버지가 진지 잡숫게 오시래요.” 큰 가마솥에 쇠죽을 끓이고 계시던 마음씨 좋은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며 “알았다.” 하신다. 이 대답은 우리 집에 일하러 오시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 빨리 달려가 그분이 다른 집에 일하러 가지 못하게 손을 써야한다. 남보다 두 세배 일을 잘하시는 분이기에 더욱 그렇다. “대톨아, 넌 오촌아저씨댁에 가라. 난 운광네 갈게.” 심부름의 효율성을 높이려 분담을 하는 것이다. “나보고만 만날 먼 집에 가래.” 동생이 투덜거린다. “너?” 주먹을 동생에게 내 보인다. 뒤뚱거리며 지게를 진 오촌아저씨가 아침 안개를 뚫고 나타나시고 다른 분들도 담배를 물다 가래침을 내뱉으며 뒤질세라 오신다. 부엌에서 아침 밥상을 차리시는 어머니는 무척 바쁘시다. 국도 끓여 푸시고 일꾼들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아침밥을 큰 밥그릇에 수북이 퍼 담고 계시다. “아이 어서 오시겨.” 인사도 빼놓지 않으신다. 멀리 통통배와 새우젓배가 떠다니는 증포바다... 그곳에 훨씬 못 미쳐 펼쳐진 벌판 한 귀퉁이가 우리 백수논이다. 용마의 전설이 서린 진강산의 맛난 우물에서 발원이 된 용내천이 굽이굽이 방죽을 거쳐 바다로 묵묵히 흘러든다. 여름이면 물장구 치고 자맥질하다 수초를 뒤져 피라미와 붕어를 족대로 건져 올리는 개울이 가을이면 수량도 줄고 얌전하다. 그러나 그 옆 냇둑 논이 장마 통에 터지기라도 하면 그해 벼농사는 망친다. 안 보이는 수렁이라도 둑에 생기면 더욱 큰일이다. 어느 해에는 폭우가 쏟아져 흙탕물이 냇둑을 위협해 둑이 터지기 직 전, 선윤이 아저씨가 목숨을 걸고 둑을 타고 넘는 물에 배를 깔아 온몸으로 막을 때 아버지는 연신 삽으로 흙을 퍼다 부어 간신히 간발의 차로 건진 적도 있다. 오늘 그곳에서 일꾼들이 지게에 볏단을 지고 달구지가 다닐 수 있는 길인 만승이네 뒷담벼락까지 날라야한다. 몇 번을 오가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새참으로 먹은 막걸리의 힘을 빌려 지게에 볏단을 많이 실으려 지게작대기를 곧추 세우고 건 사오십 개의 볏단을 싣는다. 행여 담배까치 내기라도 걸리면 남정네들의 자존심을 걸고 더 많이 실을 것이고... 워낙 노련한 분들이라 그 무거운 지게를 메고 일어서기면 하면 리듬을 타고 잘도 걷는다. “끄응!” 목에 핏줄 세워 남영네 아버지가 지게작대기를 버텨 일어서면 그 다음 운광네 아버지 그 다음 오촌 아저씨 순이다. 또 다른 구연네 아버지도 계신데 체수가 작아 세분의 힘자랑에는 못 낀다. 특히 이 네 분에게는 울어도 시원치 않을 웃지 못 할 사연이 있다. 어느 날 네 분이서 가래 드렁을 맬 때 논물에 베적삼이 젖으니 모두 아랫도리를 벗고 일을 하셨다한다. 그런데 늦게 담배를 배우신 오촌아저씨가 담배를 태우시다 네 분이 벗어 가지런히 모아 놓은 베적삼 바지에 무심코 담뱃불을 던져 불이나 홀라당 바지가 다 타버렸다는 것이다. 속 고쟁이만 걸친 네 분이 밑천을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꼴은 정말 가관이고... 너무나 우스워 아낙들은 숨죽여 웃고...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니 참다못한 구연네 어머니가 눈을 연신 질근거리는 오촌아저씨에게 걸쭉하게 입담을 늘어놓았단다.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육실할 놈의 영감탱이가 뭔 놈의 담배는 다 늦게 배워 남의 영감 바지까지 태우고 난리니이꺄? ” 개울을 겨우 건넌 볏단을 실은 달구지가 무게중심을 잃어 넘어가 속상하다. 개울물에 빠지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동여맨 바를 풀고 달구지를 일으켜 세운다음 볏단을 다시 싣느라 북새통이다. 황소도 놀랬는지 두 눈을 껌뻑거린다. 어머니는 나락이 떨어질까 노심초사다. “일 년 내 어떻게 지은 농사인데..” 혀를 차신다. 저녁이 되어 시연네 아버지 박첨지는 밥 먹을 때만 슬쩍 와 볏단 서너 개를 던지고는 제일먼저 밥상머리에 앉는다. 이윽고 집 앞마당 죽순나무 옆에 노적가리가 큼지막하게 올라간다. 형이 크레용으로 크게 그려 놓은 대문짝의 “큰 대문”이라는 글자가 유심히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 같다. 인천의 명문중학교에 유학 간 형은 바닥을 긁지 않고 공부라도 잘 하고 있는지? 형의 성적도 그렇게 쑥쑥 올라가야 하는데... 하숙하는 집의 딸과 일전에 물바가지를 가지고 싸웠다는 소리만 들리고... 문득 용대는 방학 때면 고향집에 내려와 잘 놀아주던 형이 그립다가도 일 안하는 형이 밉다는 생각이 든다. 저녁을 물린 일꾼들이 가물거리는 등잔불 밑에 둘러앉아 아버지가 품삯으로 나눠줄 빳빳한 지폐를 기다리고 있다. 선생 네라 품앗이도 아니고 현찰이 당장 주어지니 눈길은 천장을 주시하는 척해도 아버지가 바스락 거리시는 반다지 쪽을 곁눈질로 힐끗 쳐다본다. “오늘 수고들 많았시다.” 아버지가 독립문이 그려진 백 원짜리 지폐 한 장씩을 돌리신다. 모두가 흐뭇한 표정들이다. “윤 선생, 오늘 미안하네. 하필이면 그 놈의 구루마가...” 달구지를 끌던 한 아저씨가 아버지께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건넨다. “아휴! 형님, 별 말씀을요.” 밤바람이 보꾹을 휘익 채자 뒤뜰 가랑잎이 구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땅거미 지자 외포리 바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저녁노을은 온데 간데 자취를 감추고 매당지 초생 달이 턱을 괘다 졸음을 쫓는다. 강화 살무니 산골마을의 하루해는 그렇게 저물어 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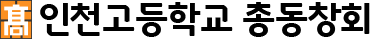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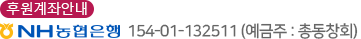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
윤인문님의 댓글
요즘은 노적가리 구경하기가 힘드네요..대부분 기계농을 하다보니 규격화된 비닐 쌓여 보관되는것 같던데....
윤용혁님의 댓글
인문형님,신종플루로 학생들 방역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멋진 형님이시기에 잘 처리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정겨운 풍경의 노적가리가 영상처럼 스칩니다.바로 타작을 하다보니..여여하세요.
김우성님의 댓글
용혁 아우님!
늘 창작에 대한 열성이 대단하십니다.
혹시, 고등학교 재학시절 수학을 가르치셨던 정윤석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없으신지요?
윤용혁(76회)님의 댓글
김우성형님,청안하시죠? 정윤석 선생님 참 열의가 대단하셨지요.수학점수 30점 이하면 모조리 엉덩이를 내 놓아야 했어요. 30점의 기준은 당시 야구선수들은 30점을 기본 점수로 준 것 같습니다. 7문항 70점 만점에 30점 따기가 쉽지 않았지요. 옆반에서 타작하기 시작하면 친구들 교련복에 체육복 껴 입던..
김우성님의 댓글
역시 용혁 아우님의 기억은 국보급입니다. 정선생님은 지금 학익고교장으로 계시고 내년 2월 정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년기념 신문을 발간하려 하는데 제자의 추억이 담긴 글이 필요합니다. 용혁 아우님이 정윤석 선생님을 기리는 수필을 하나만 써 주세요. 이 곳에다 써 주시면 제가 퍼 갈까하는데 어떠세요.15일한으로
윤용혁님의 댓글
우성형님, 죄송합니다. 이제야 댓글을 본 이 동생을 용서하세요. 15일이면 이틀이나 지났군요.어쩌죠? 송구하옵니다.진작 들어와야하는데요...그저 죄송...행여 지금이라도 괜찮은 지요?형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