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글
어머니의 가을일기장
본문
 국어 산수를 백점 받은 일제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아침 조회시간에 부상으로 받은 공책 몇 권을 들고 종례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에게 빨리 자랑하고 싶어 살무니 집으로 내달렸어요. 길가 빛바랜 풀 섶 사이로 개구리가 폴짝이고 갈색군복으로 갈아입은 메뚜기들은 용대의 달음박질에 놀라 이리저리 뛰어 올랐죠. 그날따라 진강산자락 초가집 둥근 지붕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숨을 까불며 집 앞 대문에 다다랐어요. 형이 크레용으로 큼지막하게 써 놓은 “큰 대문”이라는 글자가 집을 지키고... 이웃집 초가지붕엔 희멀건 엉덩이를 자랑하던 박들만이 옹기종기 남아 있었죠. “어머이! 어머이! 저 일등 했시요.” 그러나 대문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자물쇠를 달고 묵묵부답 말이 없었어요. 오늘도 어머니는 논틀밭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추수를 하러 가신 것이지요.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는 정말 싫었어요. 옆집 아주머니 댁에 들러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어야만 했어요. 왜냐면 피사리를 위해 새 논으로 가셨는지 아니면 은행낭골 윗마을 밭으로 가셨는지를 알아야 했지요. “새 논”은 어머니가 억척스럽게 일해 사신 논이라 그리 이름이 붙여졌지요. 세간날 때 비가 많이 내리면 매번 둑이 터져 논농사를 망치는 냇둑 논을 받아 나오신 것이 한스러워 새 논을 사셨다죠? 넉가래 밭을 팔고... “우리 어머이 어디 가셨는지 아시꺄?”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아까 보니까 웃말 밭으로 가시는 것 같더라.” “탁! 탁! 탁! 탁!” 어머니가 하얀 천을 깔고 참깨를 털고 계셨어요. 파란 하늘에서 내리 쪼이는 따가운 햇볕을 쬐시며 쪼그려 앉아... 참께는 입이 벌어지기 전에 베었다가 모아 잠시 말린 후 털어야만 했지요. 수수도 목을 쳐 군데군데 모아놓으셨더군요. “어머이! 나 공책 받았어요.” “그래? 어구 내 둘째아들!” 어머니는 엉덩이를 두드려 주시며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 머리에 수건을 두르신 어머니 이마 사이로 땀이 주르르 흘렀어요. 온갖 농사일로 손마디는 굵어 지셨고 얼굴은 검게 그을리셨군요. 공부 잘했다고 빵을 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몇 이랑 고추밭에 빨갛게 익은 고추를 수고하시는 어머니를 대신해 따 드렸죠. 허리를 굽혀 고추를 따다보니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매일 논밭에 나와 일하시는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물커덩.” 고추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있군요. 한 무리의 고추잠자리가 군무를 이루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죠. 비행에 힘든 녀석은 잠시 고추말뚝에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쉬고 있고요. 참깨 털기를 마치신 어머니는 콩도 꺾으시고 팥도 따 앞치마에 쉴 새 없이 쑤셔 넣으셨어요. 까맣게 익은 녹두는 내일 따시겠다고 하셨어요. 노란 조와 같이... 정말 윗말 밭에는 온갖 곡식이 다 심어져 있었죠. 이미 거두어진 보리와 밀, 그리고 콩, 팥, 수수, 조, 녹두. 사질토에는 땅콩, 고추 등 무진장 많았죠. 콩과 팥은 사발장사가 집에 왔을 때 그릇과 바꾸는데 줄 요량으로 심으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유난히 그릇에 애착을 보이시는데 아마 시집오실 때 제대로 된 밥그릇 하나 챙겨 오시지 못한 것이 가슴에 남아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서툰 글씨의 외상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태하모이 사발 외사까 사배건” "시태할머니 사발 외상값 사백 원"을 그리 적으셨던 것이에요. 일제 때 보통학교를 다니셔서 우리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아무튼 어머니의 정성이 윗말 밭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해가 서산에 걸리면 그때서야 어머니는 바리바리 수확한 곡식들을 꾸리셨어요. 뭇 사내들과 물꼬 싸움을 벌이며 억척스럽게 단련된 어머니의 손잔등도 새끼줄을 당기실 때만큼은 바르르 떠셨어요. 몇 번을 오가며 추수한 꾸러미를 나르셨지요. 발발 떠시며 머리에 곡식더미를 이시다 그만 나동그라지셨어요. “에그 머니나!” 어처구니가 없어 혼자 웃으셨지만 그건 어쩌면 울음이셨는지도 몰라요. 조실부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에게 시집와 온갖 궂은일을 다 하셨으니... 가을이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죠. 밤이면 끙끙 앓으시던 어머니... 그래도 다음날은 어김없이 일어나 또 논밭을 헤매실 것이고... 그날 윗말 밭에서 수확한 마지막 짐을 나르게 되었어요. “용대야, 이건 네가 지게에다 좀 지겠니?” 힘에 부치신 어머니의 부탁이었죠. 어미 소의 뒤를 따르던 송아지가 “음 메” 하며 산길을 내려왔어요. 선덕이네 굴뚝에서 저녁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어머니의 가을 일기장을 덮어야겠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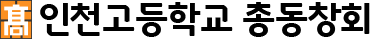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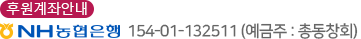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
오태성님의 댓글
윤용혁후배님의 용대 이야기는 언제나 보아도 내마음을 짠 하게하는 그무언가가 있음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죄 스러움 ...못 다한 효도..생전에 보여주셨던 잔잔한 미소
눈 시울이 뜨거워 지네......
윤용혁님의 댓글
오선배님,어머니의 가을일기가 당시 모든 어머니들의 애환이셨겠지요. 오늘의 밥술이 어머니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거에요.선배님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여여하세요.
윤인문님의 댓글
글만 읽어도 눈에 선한 풍경과 힘든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쩌면 용혁후배의 표현력은 가히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네요.
윤용혁님의 댓글
존경하옵는 인문형님,늘 청안하시지요? 잘 보필도 못해드리고..그래도 멋진 형님의 향기가 이곳까지 전해 옵니다.늘 건강하시고 매사 정진하시는 모습이 후배들에게는 귀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