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글
개학이 다가오면
본문
 찜통더위도 가시고 매미의 울음소리도 마당 앞 죽순나무에서 간간이 들릴 무렵이면 개학날이 다가온 것이다. 읍에서 방학동안 작은아버지 댁에 놀러왔던 동그랗고 귀여운 사촌 여동생 애영이도 갔다. 성 너머 큰댁의 인삼밭 원두막에서 도란거리던 추억을 뒤로한 채... 뒤뜰 텃밭의 오이는 용케 동생의 눈을 피해 천덕꾸러기인 노각이 되었고 마당을 비행하다 잠시 돼지우리 말뚝에 살포시 내려앉은 고추잠자리는 모자이크 눈을 두리번거리며 가을학기가 곧 시작됨을 알렸다. 아직도 쓰르라미는 감나무 그늘에서 바소쿠리지게를 내려놓고 낮잠 자는 윤서네 아버지 코 고는 소리를 닮아 감나무 높은 곳에서 엉덩이를 달싹이며 연신 울어댔다. “니들 방학숙제 다했냐?” 어머니의 성화가 이어졌다. 만날 놀기만 하다 개학날이 다가와서야 허둥대는 용대와 동생이 미덥지 않으신지 혀를 끌끌 차시며 재차 물으셨다. “일기는?” 큰일이었다. 일기쓰기를 건 한 달을 미루다 보니 그날의 날씨에 딱 걸렸다. 아주 곤혹스럽다. “어머이! 광복절 날 비 왔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버럭 소리를 내 지르셨다.
“에라! 모르겠다. 맑음이다. 만약에 들통 나면 우리 동네에 그날 비 왔다고 우기지 뭐.” 일기내용도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놀다 저녁 먹고 잤다.”라고 반복해 쓰기를... “대톨아! 그거 뭐냐? 여기는 비가 오는데 다른 데는 안 오는 것? 지.. 뭐라 했는데?” 연필심을 혓바닥에 꾹꾹 눌러 밀린 일기를 배 깔고 내 옆에서 쓰던 동생에게 물었다. “지? 음~~ 지렁이. 비오는 날 많이 나오잖아? “아니야!” “그럼 지랄 비?” “뭐라고? 내 미쳐! 너 같은 돌대가리를 믿고 내가...” “돌대가리? 그러는 형은?” “야! 조용히 일기나 써! 물은 내가 잘못이지..에이!” 장난꾸러기인 두 살 터울의 애꿎은 동생에게 괜한 면박을 주었다. 그제야 생각나 "지형성 강우다! 너 뭔 말인지 알아 인마?" 동생 앞에서 한껏 어깨를 으쓱했다. 굴뚝 뒤에서 찰흙을 빚어 탱크모형을 만드는데 도대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탱크의 포신이랍시고 붙인 것이 어린 아이 고추처럼 뾰족해 웃기기도 했지만 붙인 부분이 자꾸만 떨어지는 것을 용케 붙여 그늘에 말렸다. 그림그리기 숙제가 문제였다. 마침 아랫집에 형과 친구사이인 정구조카가 누나에게 잘 보이려 그려준 그림을 가로챘다. 용대보다 나이는 많지만 용자아래 구자돌림으로 조카뻘이다. 저학년으로써 너무 잘 그린 그림이라고 어머니가 누나에게 주라는 것을 졸라 거기에 조금 못 그린 것처럼 하려고 마구 색칠을 더해버렸다. 덕지덕지... 그러다보니 좋은 그림을 완전히 망쳐 낙서장이 되었지만 어쩌랴... 곤충채집으로는 메뚜기와 잠자리 그리고 매미가 유일하였다. 그냥 핀으로 등판을 대충 찔러 두꺼운 도화지에 한 서너 마리 박아 놓았다. 채집한 곤충의 방부를 위해 알코올 주사를 놓으라고 했는데 당시 알코올이라곤 문숙이네 가게 큰 독에서 팔던 막걸리 말고 알코올이 어디 있으며 주사기는? 마침 집에 어머니가 동네에서 폐병을 앓고 있던 아랫집누나에게 놔주던 유리로 된 주사기를 본적이 있다. 그러나 옆집 부스럼 딱지를 달고 살던 상용이를 돌파리 간호사인 어머니가 항생제를 놔 주다 부작용이 나 상용이가 게거품을 물고 헐떡거리던 것을 본 터라 너무 무서워 감히 엄두가 안 났다. 상용이는 그날 읍내로 급히 실려가 살아났지만 만약에 그 애가 잘못되었다면 어머니는 붙잡혀 갔을 것이다. 많이 놀라신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무료로 놔주시던 주사기를 내려 놓으셨다. 그러나 애지중지 기르던 돼지새끼들의 설사병이 나면 주사를 잘도 찌르셨다. 식물채집은 포기하기로 했다. 풀들을 이것저것 채집했는데 이름을 모르겠다. 들판에서 뜯었는데 책갈피에 지질러놓고 한참 지나니 콩잎이나 깻잎을 제외하고는 도통모르겠으니 말이다. 동생이 한 숙제들을 보니 하는 둥 마는 둥, 정말 가관이었다. 그래도 무사태평으로 걱정이 없어 보였다. 마당에서 내려다보이는 증포바다에 노을이 빨갛게 물들면 어머니께서 수제비를 끓여 앞마당에 밀거적을 펼쳐 내 놓으셨다. 너나할 것 없이 온가족이 밥상에 둥그렇게 둘러앉았다. 뜨거운 수제비를 한 숟가락 떠 입으로 후후 불다 여린 배추를 솎아 만든 김치를 얹어 입안에 털어 넣으면 제 맛이 났다. 뜨겁지만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 용대는 불룩 나온 배를 통통 두드렸다.
땅거미가 내려와 앉았다. 서산 매당지에 유난히 밝은 샛별이 제일먼저 떠올라 환한 미소를 지었다. 때 이른 귀뚜라미가 부뚜막에 숨어 노래하다 사레가 들렸는지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내일이면 개학이다. 양지깨 지름길을 택해 학교에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용대는 종종걸음을 바삐 옮길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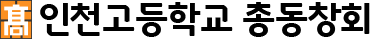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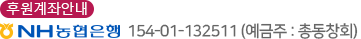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
임영섭님의 댓글
소싯적 정겨웠었고 토속적이었던 시어들--이를테면 노각,쓰르라미,바소쿠리지게,매당지 등등--을 오랜만에 그것도 동기 글속에서 보니 새록새록 그시절 느낌을 일깨우는게 색다른 맛이넹..근데 하나 틀린 문구가 옥에 티라 바로잡는당..사래-->사레가 맞는말 아닌감??ㅋㅋㅋ
임영섭님의 댓글
근데 니는 고향이 오데냥?인천의 날거적 똥파리들이 평소 눈앞에서 접하는 세상풍경은 아니거덩?ㅋㅋㅋ 증포 운운하는거 보이 경기도 이천 같기도 하공?
윤용혁님의 댓글
영섭아,고맙데이~~ 동기가 있어 큰 쓰는 보람이 있구나..사레가 맞다.아주 친절한 친구일세.감사! 인천의 날거적 똥파리? ㅎㅎㅎ친구의 걸칙한 입담에 미소짓네. 난 강화일세.그것도 한참 들어간 살무니라고 산골마을일세.여여하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