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의마을
무적엽
본문
雨中萬谷無一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비 내리는 수많은 계곡 물 한 방울 없고
滿山樹草無一葉
온산 가득 나무와 풀 있어도 이파리 한 장 없네.
無滴無葉又非無
물 한 방울 이파리 한 장 없는 것 역시 없다 할 수 없으니
開門出空踏一足
문 열어 빈 것 털고 나가 한 걸음 밟아보라.
하하하하
누군가 입 열면 그르친다고 했다.
그 한마디 움켜쥐고 수천 년을 떨었다.
금과옥조도 그런 금과옥조가 없고
철옹성도 그런 철옹성이 없다.
허물라 가르치고는 누구도 허물기 어려운
아니, 허물 엄두도 못 낼 벽, 모두가 지니게 했다..
참으로 자상하고 편리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몰라도 이 한마디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되었고
난처해도 이 한마디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
얻었건 못 얻었건 이 한마디면 세상을 두려움에 떨고 놀라게 할 수 있었고.
다물고 그저 바라만 보아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해결해 주었으며
권위도 위엄도 그저 이 한마디만 잘 흔들면 담쟁이 넝쿨번지듯 번진다.
굳이 힘들일 필요 있겠는가?
전가의 보도와 같은 이 칼 번득이면 될 것을.
백 명도 만 명도 숙이게 할 수 있고
경외심도 존경심도 이 칼날 위에 엷은 미소만 얹으면 되는 것을.
그러니 이 말 능숙히 잘 써도 될 때까지 요량 것 처신하곤
언젠가 묵인되면 두 눈 내리깔고 나지막이 던지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모두가 알아서 한다.
열면 그르친다.
그러니 열지 마라.
알아도 몰라도 그저 다물라
깨달아도 깨닫지 못해도 그저 다물라
넘었어도 건넜어도 그저 다물라
누구든 열면 그르친다.
이렇게 애틋하게 보듬으며 한 생을 보란 듯 얹은 이 적지 않고.
지금도 열심인 자 그 얼마 인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돌고 돔을 즐길 수 있으니.
누가 열고 열어야 하나?
언제 어떻게 여나?
열어도 되었다던 몇몇은 왜 그래도 되었던가?
가르침이 넘쳐나고 지나침이 아닌가?
태초의 보였음이 넘쳐나고 지나침을 경계함이라면 이는 무엇인가?
열면 그르치는 것, 반 바퀴만 돌아도 열지 않아도 그르친다는 것은 아닌가?
어리석은 이들이 어리석은 대로 다가와야 하고
무지몽매한 자들이 무지몽매한대로 다가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가르침 신봉하며 따르고 넘겨준 자, 정녕
바늘 꽂을 곳 없다 하고는 도솔천 이고 선 댓 기둥 꽂은 것은 아닌가?
함부로 다물지 마라
연자 함부로 그리 말하고 그리 보지 마라
진정 넘었고 건넜는지는 열고 열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닐지니
어리광 부리듯 입 가지고 채근 마라
편케하고 편케하는 것이 가르침의 한 켠이라면
누구에게도 비껴나간 말 한마디로 뒤집어 겨누려 해서야 되겠는가.
그 또한 스스로의 양 걸침을 그대로 들어냄일지니.
열 때 열라.
그리고 다물 때 다물라
열어도 다문 듯 열고 다물어도 연 듯 다물라
그러면 열고 닫음 사이에 오른 발과 내린 발이 다르지 않음에 서리라.
열어서 만가지 중 한가지라도 얻는다면,
어차피 보이는 날 아침 나절 만가지 얻을 수 없다면,
굳이 얻음을 삼킨 자들이여 함부로 다물지 말고
연자의 입 속에 함부로 젖은 혀 넣지 마라.
그 또한 자칫 얻었음에 갇힌 비틀린 안주함이 될 것이니.
구지수지, 설두타지
어설피 건드리면 화광토출.
會
會!
하하하하!
설암 방석남
<제가 4년 간 집필하여 근간에 출판 예정인 무적엽 책의 서문과 직접 쓴 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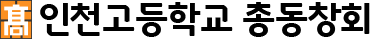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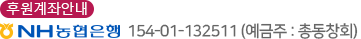










댓글목록 0